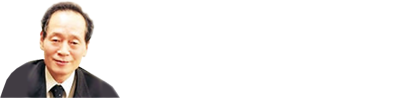정순태의 역사산책
자료실
[집중연재] 「민족사 제1인물」金庾信과 그의 시대 ④
정순태 | 2003-02-16 | hit 2649
將(장)으로서 김유신은 인생 50~60대에 절정기를 맞는다. 오늘날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낮았을 신라 당시에 진골귀족의 나이 50이라면 고위 京職(경직)에 앉아 권력을 다투거나, 아니면 정치 2선에서 여생의 부귀나 누렸겠지만, 김유신은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야전사령관으로 분투했다.
김유신은 押梁州(압량주:경북 경산) 軍主(군주; 군관구사령관)의 직책에 있던 선덕여왕 13년(644)에 관등이 한 단계 올라 제3위인 蘇判(소판)이 되었다. 그의 나이 50이었다. 이해 가을 9월, 그는 上將軍(상장군)이 되어 백제의 加兮城(가혜성; 지금의 거창) 등 7성을 공격하여 대승했다. 이로써 그는 낙동강의 水運(수운)을 再(재)개통하여 신라의 物流(물류)를 회복시키고, 다음 해 정월에 王京(왕경)으로 돌아왔다. 이 시기 羅濟(나제) 간 쟁탈의 요지는 낙동강 서안 지역인 경남 합천·거창 일대였다.
바로 그때 백제의 대군이 낙동강 상류의 買利浦城(매리포성)을 공격하자, 여왕은 다시 김유신에게 上州將軍(상주장군)을 제수하고 방어하도록 했다. 김유신은 가족들도 만나지 않은 채 출전하여 역공으로 백제병 2천명의 머리를 베었다. 3월에 개선한 그는 또다시 백제군이 서부 전선에 집결하고 있다는 급보를 접한다. 이번에도 그는 귀가하지도 못하고 서부전선으로 달려가 백제군을 물리쳤다.
이렇게 김유신은 불과 6~7개월 사이에 세 방면의 야전에 출전할 만큼 분망했다. 이것은 백제 義慈王(의자왕)이 全(전) 전선에 걸쳐 신라를 압박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50대 답지 않은 체력과 지모를 지닌 김유신이 신라의 방패로 나섰다는 점이 의자왕의 불운이었다.
645년이라면 唐(당) 태종이 20년간이나 별러 오던 고구려 침략을 처음으로 감행했던 해였다. 신라는 백제와 교전 상태임에도 唐軍(당군)에 호응하여 3만병을 동원하여 고구려 南境(남경) 쪽에서 제2전선을 형성했다. 이때 신라군이 고구려 軍과 직접 교전했던 기록은 없지만, 이로 인해 신라 본국의 방어 태세가 허술해졌던 것 같다. 이 틈에 의자왕은 신라 서쪽 변경의 7개 城(성)을 공격하여 점령해버렸다.
舊 귀족세력의 반란 진압
신라는 守勢(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이런 외환 속에서 647년 서라벌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주모자는 舊(구)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상대등 毗曇(비담)과 대아찬 廉宗(염종)이었다. 반란의 명분은 女主不能善理(여주불능선리), 즉 여왕은 정치를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당 태종도 일찍이(643년) 신라가 보낸 請兵使(청병사)에게 말하기를, 『그대 나라가 여자를 왕으로 받들고 있으니, 이웃나라가 輕侮(경모)하는 것인데, 우리 황족 한 사람을 보내 그대 나라의 왕으로 삼는 것이 어떠냐?』면서 노골적인 탐욕을 드러낸 바 있었다. 비담 등은 이런 대내외적 정세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여왕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반란군은 明活城(명활성)을 점거하여 본거지로 삼았다. 명활성은 지금의 경주 보문관광단지 바로 남쪽 산에 축조해 놓았던 王京의 外城(외성)이니까, 王城과는 불과 10여 리 거리다. 김유신이 이끄는 관군은 王城(왕성)인 月城(월성)에 진을 쳤다. 양군은 10일간이나 공방전을 벌였으나, 좀처럼 결판이 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밤에 큰 별이 月城 쪽에 떨어졌다. 이에 비담은 반군의 기세를 돋우기 위해 점성술을 이용한 심리전을 전개한다.
『별이 떨어진 자리에는 반드시 피가 흐른다. 이는 여왕이 패전할 조짐이다』
이에 고무된 반군의 함성이 천지를 흔들었다. 여왕이 몹시 두려워하자, 김유신이 여왕을 뵙고 말했다.
『길흉에는 법칙이 없으니 오직 사람 하기에 달렸습니다. 德(덕)은 요사함을 이기는 것이니, 별의 변괴 따위는 가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는 근심하지 마소서』
이어 김유신은 관군의 사기를 되살리기 위해 기상천외의 연극을 꾸민다.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을 붙이고 그걸 연에 실어 하늘로 띄워 보냈던 것이다. 이로써 마치 떨어진 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리고는 다음날 즉각 소문을 낸다.
『어젯밤에 별이 떨어졌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점성술을 이용한 반란군 측의 先制(선제) 심리전에 역시 점성술로 대응했던 김유신의 수법은 그 방법론적인 면에서 매우 지혜롭다. 관군의 軍心(군심)을 다스린 그는 또한 백마를 잡아 별이 떨어진 자리에 제사를 지내면서 다음과 같이 기원했다.
『天道(천도)에는 陽(양)이 강하고 陰(음)이 부드러우며, 人道(인도)에는 임금이 높고 신하가 낮습니다. 만일 이 순서를 바꾸면 大亂(대란)이 일어나고 맙니다. 지금 비담의 도당이 신하로서 임금을 모해하며,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범하니, 이는 이른바 亂臣賊子(난신적자)로서 사람과 신령이 미워할 일이요, 하늘과 땅이 용납하지 못할 일입니다. 지금 하늘이 이에 무심하여 도리어 별의 변괴를 王城에 보인 것이라면, 이는 臣이 믿을 수 없는 일이니 알 수 없는 바입니다. 하늘의 위엄으로서 인간이 소망하는 대로, 善을 善으로 여기고 惡을 惡으로 여기게 하여, 신령을 탓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사를 마친 후 김유신은 장졸들을 독려하여 분연히 돌격하니, 비담 등은 대패하여 도주했다. 김유신은 추격전을 전개하여 비담의 목을 베고 그 9족을 멸했는데, 이에 연좌되어 죽은 자가 30명에 달했다.
선덕여왕 말년의 반란은 신흥 귀족 세력과 舊 귀족 세력 사이의 헤게모니 쟁탈전이었다. 자녀를 두지 못한 선덕여왕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할 상황이었던 만큼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실력자 간의 무력 대결이 벌어질 만도 했다. 그 결과는 선덕여왕의 4촌 동생 眞德女王(진덕여왕)의 후계를 반대하면서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려 했던 비담의 패망이었다. 진덕여왕의 왕위 계승은 김춘추의 즉위를 향한 징검다리가 된다.
大化改新 주체세력과의 관계 개선
「日本書紀(일본서기)」에 따르면 비담의 반란을 전후한 시기에 김춘추는 백제의 동맹국으로 배후에서 신라를 위협해 오던 왜국으로 건너가 있었다. 당시 왜국은 642년의 大化改新(대화개신)을 주도한 中大兄(나카노 오에; 뒷날의 天智天皇) 황자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대화개신은 나카노 오에 皇子가 中臣鎌足(나카도미노 가마다리) 등과 합세하여 여자 천황 皇極(고교쿠)의 면전에서 집권자인 蘇我入鹿(소가 이루카)을 참살한 유혈 쿠데타였다. 이루카가 난도질당하자, 그의 아버지이며 막후 실력자였던 蘇我蝦夷(소가 에미시)는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알고, 그의 아성 葛城部(갈성부)에 불을 질러 자결했다.
그때까지 왜국은 지역과 혈연을 기반으로 한 귀족들의 聯政(연정) 체제였다. 이들 가운데 최고의 권력을 휘두른 씨족이 百濟(백제) 木氏系(목씨계)인 蘇我(소아) 일족이었고, 천황은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다. 대화개신의 쿠데타로 4代 1백년간 집권해 왔던 蘇我 일족은 완전 몰락했다.
그러면 김춘추가 권력 교체기의 왜국을 상대로 모험 외교를 감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백제의 고립을 겨냥하여 왜의 새 집권 세력과 우호 관계를 맺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日本書紀」엔 이 때 김춘추의 모습에 대해 美姿顔 善談笑(미자안 선담소), 즉 용모가 훌륭하고 담소를 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왜의 임금을 天皇(천황)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 오늘의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일찍이 聖德(쇼도쿠) 태자가 집권했던 시기(607년)에 여왕 推古(스이코)는 수 양제에게 보낸 국서에서 자신을 당당하게 天皇으로 칭했다.
『아침해 떠오르는 동쪽 나라의 천황이 해가 지는 서쪽 나라의 황제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간 안녕하십니까?』
이런 허두로 시작되는 對隋(대수) 외교 문서의 작성을 주도한 쇼도쿠 태자는 오늘날 일본 민족주의의 상징적 인물로 손꼽히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당시의 왜가 어느 정도로 국제 정세에 둔감했는지를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 같은 倭(왜)의 국서를 접한 수 양제는 벌컥 화를 내면서 『蠻夷(만이)의 書(서)가 무례하니 다시는 받지 말라』고 鴻月盧卿(홍려경:使臣 접대 관청의 長官)을 꾸짖었다.
이후 천황은 어디까지나 왜의 국내용 호칭이었고, 대외적으로 공인된 지위는 왜국왕이었다. 수·당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일이 절실했던 왜로서는 중국의 조공책봉 체제에 들어가야만 그것이 가능했고, 그러려면 왜국왕이란 칭호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대륙과 陸接(육접)했던 우리 민족 국가의 군주가 황제나 천자의 칭호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오늘의 우리가 우리 민족사에 대해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바다 멀리 떨어져 살던 왜인이 그들 임금의 국내 호칭을 천황이라고 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까닭도 없다.
또한 중국이 황제국을 자처했다지만, 중국의 역사를 개관해보면 그것도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 중국인의 절대다수인 漢族(한족)은 실로 오랜 세월에 걸쳐 피눈물 나는 피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 왔다.
중국의 중심 무대였던 양자강 이북 화북지역에서는 수·당 시대 직전까지 다섯 오랑캐(五胡) 민족의 16개국이 부침하면서 漢族을 지배했다. 이런 5호16국 시대의 대표적 왕조인 前秦(전진)은 티베트系 羌族(강족)의 국가였고, 後魏(후위)는 鮮卑族(선비족)이 세운 나라였다.
隋와 唐의 왕실은 漢族 출신으로 자처했지만, 그 혈통 속에는 鮮卑族과 狄人의 피가 짙게 흐르고 있던 이른바 胡漢 雜種(호한 잡종)이었다. 唐末(당말) 5代의 나라들도 거의 이민족 군벌 등이 중국 대륙을 분할하여 세운 나라들이었다.
그 후 漢族 국가인 北宋(북송)이 1백60년간 중원을 차지했지만, 거란족의 나라 遼(요)를 섬기며 영토 할양 등 온갖 수모를 받았고, 뒤이어 遼를 멸망시킨 여진족의 나라 金의 침략을 받아 양자강 이북을 빼앗기고 강남으로 쫓겨가 1백50년간 南宋(남송)으로 잔명을 겨우 이어갔다. 그런 南宋도 북방 초원에서 흥기한 칭기즈칸의 몽골족에게 계속 압박을 받아오다 그 손자인 쿠빌라이칸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 몽골족의 정복왕조 元(원)은 민족 차별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漢族을 최하위인 제4의 신분으로 강등시켜 유별나게 괄시했다.
그후 1백년 만에 漢族 비적 출신인 朱元璋(주원장)이 일어나 元을 漠北(막북)으로 내쫓고 中原을 되찾아 明을 세웠다. 이런 明은 2백여년 만에 다시 여진족(만주족)이 세운 淸(청)에 멸망당하고 만다. 淸은 중국을 3백년간 지배한 정복왕조였다.
이상이 중세 이래 중국의 역사로서 漢族은 동족 왕조보다 이민족 왕조의 지배를 훨씬 오랫동안 받아온 피압박 민족이었다. 이것이 오늘날 중국인민을 구성하는 민족의 수가 50개를 넘게 된 까닭이다. 漢族은 압도적인 인구수와 유목민족에 비해서는 월등한 문화로써 자신들을 지배했던 이민족을 다만 중국인의 범주에 넣어 왔을 따름이다.
해골 2구와 裨將 8인의 맞교환
그에 비하면 韓民族의 역사는 1천년의 신라(삼국시대 포함), 5백년의 고려, 또 5백년의 조선왕조로 이어지면서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보해 왔다. 섬나라로 뚝 떨어진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국 대륙과 북방 초원 지대의 정세 변화에 따라 강풍의 영향권에 휩싸여야 했던 韓民族이 이런 정도의 주체성과 민족 문화를 보전 발전시켰다는 것은 대단히 경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과 陸接했던 민족들 가운데 오늘날 韓國만한 수준의 나라를 세운 민족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중국의 군주가 황제였든 倭의 군주가 天皇으로 자처했든 오늘날의 우리가 상관할 까닭이 없다. 영국은 18세기 이래 2백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해 지지 않는 나라」였지만, 영국 군주의 호칭은 왕(King) 또는 여왕(Queen)이었다. 반면 동시대에 영국과 해외 식민지 쟁탈 경쟁에서 번번이 패배한 프랑스 군주의 호칭은 황제(Emperor)였다. 더구나 오늘날에는 영토의 크기나 인구가 과거처럼 중요하지 않고, 국가원수의 호칭 같은 것은 상징적 의미조차 없다.
김춘추가 對倭(대외) 모험외교를 전개하는 동안 비담의 반란을 진압한 김유신은 다시 신라의 정권 교체기의 약점을 겨냥한 백제 의자왕의 대공세에 대처해야 했다. 진덕여왕 원년(647) 겨울 10월에 백제군은 신라의 茂山(무산:전북 茂州), 甘勿(감물:경북 고령군 知禮), 桐岑(동잠:충북 충주) 등 3개성을 포위 공격했다. 진덕여왕은 김유신에게 보병과 기병 1만을 주어 이를 방어하게 했다. 이 전투에서 김유신 軍은 백제군을 대파하고 3천여명의 머리를 베었다.
이어 진덕여왕 2년(648) 3월에는 백제 장군 義直(의직)이 서쪽 변경을 침범하여 腰車城(요거성:경북 문경 지방) 등 10여 성을 점령했다. 여왕이 이를 걱정하여 押督州(압독주:경북 경산) 도독 김유신을 급파했다. 김유신은 다섯 갈래의 길로 진격하여 의직의 군진을 대파했다. 바로 병법에서 말하는 分進合擊(분진합격)이었다.
648년 김유신의 전공은 혁혁했다. 특히 大梁城(대량성:경남 합천)의 백제군을 성 밖으로 유인해낸 김유신의 미끼작전은 탁월했다. 대량성은 6년 전인 642년 백제 장군 允忠(윤충)에게 함락된 전략적 요충지였다.
김유신은 술타령으로 군무를 태만히 하는 척하여 백제군의 경계심을 늦추면서 병사들에겐 강훈을 시켰다. 병법에서 말하는 虛虛實實(허허실실)의 계책이었다. 대량성으로 진군한 직후에는 신라군의 전력이 열세인 것처럼 가장하며 후퇴를 거듭했다. 백제군이 미끼 작전에 걸려들어 추격전을 벌이자, 김유신이 玉門谷(옥문곡)에다 미리 숨겨둔 복병을 일으켜 대승했던 사실은 이미 앞에서 거론한 바 있다. 이 때 김유신은 백제의 裨將(비장) 8명을 사로잡았는데, 「삼국사기」 열전이 전하는 그 뒤처리 또한 빈 틈이 없었다.
<유신은 사람을 시켜 백제의 장수와 교섭하기를, 『우리 軍主 品釋(품석)과 그 아내 김씨의 뼈가 그대 나라의 옥중에 묻혀 있다. 이제 그대의 비장 8명이 나에게 사로잡혀 목숨을 구걸하고 있다. 나는 여우나 표범이 죽을 때 머리를 제 고향으로 두는 뜻을 생각하여 그들을 차마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대는 죽은 두 사람의 유골을 여덟 명의 산 사람과 바꾸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했다>
2인의 백골과 8인의 비장을 맞바꾸는 거래의 손익은 어떠할까? 우선 백제측의 반응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백제의 좌평(관등 제1위) 忠常(충상)이 의자왕에게 말하기를, 『신라인의 해골을 남겨 두어 유익할 것이 없으니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신라인이 신의를 버리고 우리 여덟 사람을 돌려 보내지 않는다면, 저들이 잘못한 것이요, 우리가 옳은 것이니,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라고 했다. 곧 품석 부처의 유골을 파서 관에 넣어 (신라측에) 보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김유신의 손익계산은 어떠했을까?
『잎사귀 하나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성한 숲이 상하지 않으며, 티끌 하나가 더 쌓인다 하여 큰 산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얼핏 보면 시체 2구와 비장 8명의 교환은 백제측에 유리했던 흥정으로 판단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론 신라의 이익이 오히려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전사자에 대해선 그 시체라도 되찾아 온다는 신라 국가의 의지가 관철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슈퍼파워 미국은 50년 전 한국전쟁 기간 중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의 유해를 찾아 오기 위해 지금도 북한측과 집요한 협상을 벌여 판문점을 통해 미군의 유해를 인도받아 오는 성과를 종종 거두고 있다. 국가 목적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을 챙기지 않는 나라는 그 구성원에 대해 애국심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3류국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해골과 裨將의 맞교환 직후, 김유신 軍의 사기는 더욱 떨쳤다.
<마침내 승세를 타고 백제 경내로 들어가 嶽城(악성) 등 12개 성을 함락시키고, 2만여명의 머리를 베었으며 9천명을 사로잡았다. (중략) 유신은 다시 진격하여 進禮(진례:충남 금산 지방) 등 9개 성을 공격하여 9천여명을 참수했다>
김유신의 명성 샘내는 唐 태종
이 무렵 김유신의 위명은 東아시아를 진동시켰던 것 같다. 바로 이해(648년) 겨울에 김춘추는 셋째아들 文汪(문왕)과 함께 長安(장안)으로 들어가 당 태종에게 원병을 요청했다. 唐 태종은 김춘추에게 실로 묘한 질문을 던진다.
『그대 나라의 김유신에 대한 명성을 들었는데, 그 사람됨이 어떠하오?』
김유신이라는 명장이 있다는데 신라가 굳이 원병을 청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뉘앙스를 깔고 있는 물음이었다. 김춘추는 역시 상대방의 속셈을 읽는 외교관이었다.
『유신이 비록 재능과 지혜가 조금 있다고 하나 황제의 위력을 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변의 우환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당 태종은 매우 흡족했다.
『참으로 군자의 나라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 태종과 김춘추는 백제와 고구려 침략을 위한 羅唐(나당) 군사동맹을 확정했다. 여기선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있을 전후 처리 문제의 원칙에도 합의했다. 그 내용은 문무왕의 대당 선전포고문에 해당하는 671년의 答薛仁貴書(답설인귀서)의 문면을 보면 명확하다. 이때 당태종은 다음과 같은 영토분할안을 제시했다.
『짐이 고구려를 치는 것은 다른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신라가 양국에 핍박되어 매양 그 침해를 입어 편안한 날이 없음을 애달피 여김이니, 山川土地(산천토지)는 나의 탐하는 바가 아니며, 玉帛(옥백)과 子女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양국을 평정하면 평양 이남과 백제 토지는 다 그대 신라에게 주어 길이 편안하게 하려 한다』
이것은 麗濟(여제)를 멸망시키는 경우의 영토 분할 약정이며, 신라에 대한 持分(지분) 보장이었다. 후세 사람은 김춘추가 왜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하지 못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당시의 힘 관계에서 신라의 이익이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다.
麗濟 멸망 후 唐이 영토 분할 약정을 위배하는 바람에 羅唐 간에 7년 전쟁이 벌어지기는 했다. 이에 문무왕의 신라가 냉정하게 당을 응징하지만, 그야 어떻든 이 때 김춘추의 對唐(대당) 외교는 신라의 입장으로선 대단한 성공작임에 틀림없다. 김춘추는 당 태종에게 사의를 표한다.
『저의 자식이 일곱이오니 원컨대 그중 하나인 文汪(문왕)으로 하여금 성상의 곁을 떠나지 않는 宿衛(숙위)가 되게 하여 주소서』
文汪에게 이미 좌무위장군의 벼슬을 내렸던 당 태종은 다시 그에게 宿衛를 겸하게 했다. 숙위라면 황제의 경호를 위해 주변국에서 파견한 왕족 혹은 귀족의 자제로서 인질적 성격도 띠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황궁에 머물며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교관 역할을 했다. 이로써 김춘추는 당 태종과 핫 라인을 개설했던 셈이다.
이후 김춘추는 정상을 향한 길을 밟아 간다. 그러나 그는 海路(해로)를 통해 귀국하다가 고구려의 해상 순라대를 만나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한다. 이때 김춘추의 목숨을 구했던 사람이 그의 시종 溫君解(온군해)였다.
위기의 순간, 온군해는 김춘추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김춘추인 것처럼 가장했다. 갑판으로 뛰어든 고구려의 순라병은 김춘추로 잘못 알고 온군해를 난도질했다. 그런 소란 속에서 김춘추는 작은 배로 바꿔 타고 신라로 복귀했다.
「삼국사기」 열전에 따르면 이때 對唐 청병 외교를 마치고 귀국한 김춘추에게 김유신은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제가 나라의 힘에 의지하고 영령의 위세를 빌어, 다시 백제와 크게 싸워서 20개 성을 빼앗고 3만여명의 머리를 베었으며, 또한 품석공과 부인의 유골을 향리로 돌아올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모두 天幸(천행)의 소치이지,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逆정보 흘려 敵將 흔들어버린 智謀
진덕여왕 3년(649) 가을 8월에 백제 장군 殷相(은상)이 신라의 石吐(석토:충북 괴산 지방) 등 7개 성을 공격하여 점령했다. 진덕여왕은 대장군 김유신과 장군 陳春(진춘), 竹旨(죽지), 天存(천존) 등을 출전시켜 대항토록 했다.
羅濟 양군은 싸움터를 옮겨 가며 10여일 동안 교전했으나 좀처럼 승패가 나지 않았다. 「삼국사기」에는 「쓰러진 시체는 들판에 가득하고, 절구공이가 뜰 정도로 피가 흐르는 상항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김유신은 道薩城(도살성:충북 청주) 아래에 진을 치고, 다음 전투를 위해 병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말을 쉬게 했다.
이때 물새 한 마리가 동쪽으로 날아가다가 김유신의 軍幕(군막)을 스쳐 지나갔다. 물새가 출현한 데 대해 막하 지휘관과 참모들은 상서롭지 못한 조짐이라고 수군거렸다. 이처럼 작은 변화 하나에도 무심할 수 없을 만큼 戰場(전장)의 심리는 미묘하다. 김유신은 참모들을 불러 가만히 이른다.
『이건 괴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늘 반드시 백제의 첩자들이 우리 진영에 정탐하러 올 것이다. 너희들은 모르는 체하며 누구냐고 묻지도 마라!』
그런 다음에 그는 즉각 각 진영에 명령을 내리기를, 『성채를 굳게 지키고 움직이지 마라. 내일 원군이 도착하면 결전을 벌인다』라고 역정보를 흘렸다. 군사가 대치하면 그 사이엔 으레 細作(세작)이 오가며 첩보를 수집한다. 백제의 세작은 「신라군이 내일 결전을 하려 한다」는 첩보를 물고 가서 殷相에게 직보했다. 은상은 援兵(원병)에 의한 신라군의 증강을 두려워하여 진퇴의 문제를 놓고 심적 갈등을 일으킨다. 장수가 흔들리면 휘하 장졸들의 사기가 꺾이게 마련이다. 將은 바위처럼 무거워야 하는 법이다.
백제군의 동요를 감지한 김유신은 그날 밤 바로 기습적인 대공세를 감행했다. 백제의 장수가 흔들렸으니까 신라의 승전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김유신 軍은 좌평(관등 제1위) 殷相과 달솔(관등 제2위) 自堅(자견) 등 백제의 장군 10명, 그리고 군사 8천9백80명의 목을 베었고, 말 1만 필과 갑옷 1천8백 벌을 노획했다. 또한 달솔 正仲(정중)과 군사 1백명은 포로가 되었고, 좌평 正福(정복)은 군사 1천명을 이끌고 항복했다.
개선군이 서라벌로 돌아오자, 진덕여왕은 왕궁 문 앞까지 나가 김유신을 맞이했다. 진덕여왕으로서는 즉위 이후 계속된 백제 의자왕의 공세를 기어이 차단했던 셈이다. 여왕은 650년 여름 4월, 백제를 꺾은 사실을 唐 고종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비단에 손수 五言詩(5언시)를 써서 김춘추의 맏아들 法敏(법민)으로 하여금 당 고종에게 바치게 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太平頌(태평송)이다.
「위대한 당 나라 왕업을 열었으니/높고 높은 황제의 앞 길 번창하여라/전쟁을 끝내 천하를 평정하고/학문을 닦아 백대에 이어지리라/(중략) 어질음 깊고 깊어 일월과 어울리고/시운도 따라오니 언제나 태평하네/큰 깃발 작은 깃발 저리도 빛나며/징소리 북소리 어찌 저리 쟁쟁한가/외방의 오랑캐 황제 명령 거역하면/하늘의 재앙으로 멸망하리라」
위의 태평송은 사대주의의 극치라고 매도되어 왔다. 어떻든 당 고종 李治(이치)의 입이 딱 벌어질 만했다. 「삼국사기」에는 「고종이 이 글을 아름답게 여기고 法敏(법민)에게 大府卿(대부경)을 제수하여 돌려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해(650년)에 신라는 법흥왕 이래의 自國(자국) 연호 제도를 폐지하고 처음으로 중국의 연호인 永徽(영휘)를 시행했다. 당은 태종 때부터 이미 신라에 대해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도록 요구해 왔다.
중국 연호의 사용은 신라가 중국의 周邊部(주변부)임을 자인하는 상징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물론 명예스러운 일이 될 수야 없지만, 나라와 백성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국가대사를 도모하면서 명분만을 좇기 어려운 것이다.
진덕여왕의 巧言令色(교언영색)은 實利를 추구한 原價(원가) 제로(0)의 외교적 립서비스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고구려 영류왕이 당 태종에게 국가의 1급 비밀인 封域圖(봉역도)를 바친 일이나 淵蓋蘇文(연개소문)이 중국의 민족종교인 道敎(도교)를 자청하여 받아들인 일 따위의 이적행위와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할 것 같다.
반대파를 복종시킨 킹 메이커의 威嚴
654년 봄 3월, 진덕여왕이 재위 8년 만에 병몰했다. 그러나 뒤를 이을 聖骨(성골) 남자가 아무도 없었다. 和白(화백)회의에서는 여러 귀족들이 이찬 閼川(알천)에게 섭정의 지위에 오를 것을 요청했다. 이는 舊 귀족 세력의 컨센서스였다고 해도 좋다.
알천은 이미 선덕여왕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 638년 10월에 여왕을 대신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巡撫(순무)에 나서는 등 중요 국사를 수행했으며, 대외 항전에 자주 참전하여 전공을 세운 무장이었다. 더욱이 그는 진덕여왕이 즉위한 647년 이후 上大等(상대등:귀족회의 의장)에 올라 있었다.
이처럼 알천은 당대 귀족사회의 대표적 인물로서 김춘추·김유신 파가 비록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도 김춘추가 왕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김유신의 파워 때문이었다.
「삼국사기」에는 「진덕여왕이 돌아가고 後嗣(후사)가 없으니, 유신이 재상인 알천 이찬과 의논하여 춘추 이찬을 맞아 즉위케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후계 왕 추대 문제를 놓고 김유신·알천 사이에 막후 절충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삼국유사」 진덕여왕 條에는 이 무렵 신라의 중요 국사는 閼川公, 林宗公(임종공), 述宗公(술종공), 虎林公(호림공), 廉長公(염장공), 庾信公이 남산 오지암에 회동하여 처리했는데, 왕위 계승자를 결정했던 회의에서 알천은 수석의 위치에 있었으나, 「諸公(제공)들은 유신의 위엄에 복종했다」고 쓰여 있다.
그러니까 신라의 귀족들은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은 괴력의 알천보다 김유신의 존재를 더 두려워했다는 얘기다. 알천공은 이미 새 시대를 개막시키는 힘의 진원지가 김춘추·김유신 동맹임을 깨닫고 태도를 명확히 했다.
『나는 이미 늙었고, 이렇다 할 만한 德行(덕행)도 없소. 지금 德望(덕망)이 높기로는 春秋公 만한 이가 없으니, 그는 실로 濟世(제세)의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群臣들이 춘추공을 추대하니, 춘추는 세 번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수락하는 형식을 취하여 왕위에 올랐다. 김춘추가 바로 태종무열왕이다. 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알천은 김유신의 힘에 눌려 왕권 경쟁을 포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김춘추는 알천을 추대한 군신들의 결의를 사실상 무시하고 왕권을 장악했던 것이다.
무열왕이 즉위하자 백제 의자왕은 군사적 이니셔티브를 쥔다. 무열왕 2년(655) 봄 정월에 백제는 고구려·말갈과 연합하여 신라의 북쪽 국경 33성을 공략하여 탈취했다. 이것은 아직 안정기에 들어가지 못한 무열왕 즉위 초기의 약점을 찌른 것이었다.
이렇게 신라는 麗濟의 협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등 뒤로는 백제의 동맹국 왜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三正面(삼정면) 방어의 위기에 빠진 신라로선 唐과의 동맹 강화가 불가피했다. 그런 상황에서 백제와 고구려는 羅唐(나당)의 통로인 黨項城(당항성:경기도 남양)을 탈취하기 위해 번갈아가며 공격한다. 당항성은 신라의 生命線(생명선)이었다.
무열왕은 당 고종에게 急使(급사)를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당 고종은 즉각 營州(영주)도독 程名振(정명진)과 좌우위중랑장 蘇烈(소열=소정방)을 파견하여 요동을 공격했다. 이것은 고구려의 배후를 침으로써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압력을 완화시켜 준 것이었다. 동아시아 세계가 나·당의 동서 동맹과 여·제·왜의 남북 동맹으로 양분되어 국제전의 들머리에 돌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열왕은 內政(내정)의 개혁과 친위세력의 전면 배치로 왕권을 강화하며 향후의 결전에 대비한다. 理方府格(이방부격:시행령) 60여 조를 고쳐 律令國家(율령국가)의 체제를 강화하고, 큰아들 법민을 태자로 세웠으며, 문왕과 인태 등 아들 넷의 관등을 한 계단씩 올렸다. 이런 조치와 동일한 시기에 「왕녀 智炤(지소)가 대각찬 유신에게 시집갔다」는 사실이 「삼국사기」 무열왕 2년(655) 10월 條에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군의 機動을 묶어두고 백제를 급습
무열왕의 제3녀 지소를 아내로 맞았을 때 김유신의 나이는 61세였다. 김유신의 큰아들 三光의 출생 연도는 알 수 없지만, 그 행적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지소가 김유신의 첫 부인일 수는 없다. 그러나 三光 등의 생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역사의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지소가 김유신의 여동생인 문명왕후의 소생인지의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김춘추는 일찍이 寶羅(보라) 궁주라는 첫부인이 있었으나 요절했다는 사실은 앞에서 쓴 바 있다. 그야 어떻든 김유신은 무열왕의 손위 처남인 동시에 사위가 되는 2중의 혼맥으로 신라 왕실과 엮이게 되었다.
무열왕 7년(660) 봄 정월 상대등 金剛(금강)이 죽자, 이찬 김유신이 上大等에 올랐다. 상대등이라면 귀족회의 의장인 동시에 오늘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바로 이 무렵 동아시아의 정세는 숨가쁘게 진전되고 있었다.
「삼국사기」에는 「(660년) 3월에 당 고종이 좌무위대장군 소정방을 신구도행군대총관, 김인문(무열왕의 차남)을 부대총관으로 삼아 좌효위장군 劉伯英(유백영) 등 수륙군 13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치게 하는 동시에 칙명을 내려 무열왕을 우이도행군총관으로 삼아 장병을 거느리고 당군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무열왕이 蘇烈의 절제를 받는 羅唐 연합군의 형성이었다. 請兵(청병)을 했던 신라로선 어쩔 수 없던 일면도 있었다.
무열왕은 5월26일 태자 法敏, 대장군 金庾信, 장군 眞珠(진주), 天存(천존) 등을 거느리고 경주를 출발하여 6월18일 南川停(남천정)에 도착했다. 이어 법민은 6월21일 김유신과 함께 대형 병선 1백 척을 거느리고 德勿島(덕물도: 경기도 남양만의 덕적도)로 건너가 蘇烈의 唐軍을 接應(접응)했다.
南川停은 오늘날의 경기도 남부 지역인 利川(이천)이다. 여기엔 신라의 6개 停(정=군관구) 가운데 서북방 영토를 관할하던 군관구 사령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신라군이 굳이 이천까지 북상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백제와 고구려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려 했던 계략이었던 것 같다. 실제론 백제를 치려고 하면서도 겉으론 고구려를 공격하는 체하는 교란전술이었던 것이다. 이런 신라군의 병력 전개는 우선 고구려의 수뇌부로 하여금 羅唐 양군이 자국을 남북에서 협공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했을 터이다. 그러니까 고구려로서는 설사 백제를 위해 구원군을 보내고 싶더라도 가볍게 動兵(동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 백제 수뇌부가 신라군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 기록의 부실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당군의 수송선들이 금강 하구로 침입하기에 앞서 덕적도에 기항했다는 점에서 백제측에서도 뒤늦게나마 羅唐 양군의 속셈을 간파했을 것이다. 고구려를 치려고 했다면 당군의 수송선들이 대동강 하구 방면으로 항진하지 않고 덕적도까지 남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用兵에선 원래 속임수가 많은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 羅唐 양군은 고구려군의 기동을 묶어 놓고, 백제에 대해선 그 주력군을 公州(공주) 계선에 집결토록 강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羅唐 양군은 戰場(전장)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격군으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던 셈이다.
그러면 김법민이 덕적도에 상륙한 당군을 접응하면서 김유신과 동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34세의 법민은 병부령(국방장관)을 겸하고 있었고, 66세의 김유신은 상대등에다 대장군의 지위에 있었다. 김법민이 일찍이 25세의 젊은 나이로 진덕여왕의 太平頌을 당 고종에게 올리는 등 對唐 외교의 일선에 활약했던 경험을 지녔다고는 하지만, 군사전문가가 아니었던 만큼 69세의 백전노장 蘇烈의 전략 협의 상대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열과의 전략회의에서 用兵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신라를 대표한 인물은 김유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덕적도에서 羅唐 연합군의 수뇌부는 백제 공략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했다. 羅唐 양군은 7월10일 금강 하류 伎伐浦(기벌포:충남 장항)에서 합류하여 백제의 도성 泗城(사비성=부여)을 공략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당군은 海路로 이동했던 만큼 백제군의 저항에 걸릴 염려가 별로 없었던 반면 백제의 영토를 가로질러 진격해야 하는 신라군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었다.
이같은 전략에 따라 무열왕은 태자 법민, 대장군 김유신, 좌장군 品日(품일), 우장군 欽純(흠순) 등에게 精兵(정병) 5만을 주어 사비성을 향해 진격토록 했다. 무열왕 자신은 今突城(금돌성: 지금의 경북 상주시 모동면 수곡리 백화산)에 거가를 머물렀다. 7월9일 김유신 軍은 황산벌(지금의 논산시 연산면·부적면)에 이르렀다.
김유신의 行軍路를 둘러싼 비밀
신라군의 행군로를 보면 경주-경기도 이천-충북 옥천-충남 논산으로 되어 있다. 이같이 병력의 운용에 대해 연구자들 사이엔 상당한 논란을 빚어 왔다. 왜 신라의 대병력이 그렇게 1천 리에 달하는 먼 거리를 우회했는지, 그 이유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연구자들은 무열왕, 김법민, 김유신 등 신라 수뇌부가 백제 공격에 동원될 대병력을 보은·옥천 지구에 남겨둔 채 호위부대 정도의 병력만 데리고 남천정으로 가지 않았겠느냐고 추측한다.
그러나 신라의 수뇌부가 소수 병력만 데리고 남천정으로 북상했다면 백제나 고구려를 교란시키려 했던 당초의 전략 목적은 달성될 수 없었을 터이다. 왜냐하면 백제와 고구려의 수뇌부도 첩보망을 활용하고 있었을 터이니까 그런 정도의 속임수에 넘어갈 만큼 무능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역사의 기록은 없지만, 신라는 백제 공략을 앞두고 적어도 10만 이상의 병력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주를 출발한 무열왕은 병력을 둘로 나누어 절반 정도의 병력을 거느리고 남천정으로 북상했다가 다시 남하하여 보은·옥천에서 全軍을 합류시킨 것으로 보인다.
무열왕을 따라 남천정으로 갔다가 다시 보은-옥천 지구로 남하한 김유신은 여기서 대기중이던 5만 규모의 精兵(정병)을 攻擊梯隊(공격제대)로 삼아 백제로 진격했고, 무열왕은 남천정까지 데리고 갔던 병력을 豫備梯隊(예비제대)로 삼아 옥천에서 60리 떨어진 상주의 백화산에다 진을 치고 공격제대의 뒤를 받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추측에는 상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천정으로 북진했다가 다시 남하하여 금돌성으로 들어갔던 병력의 장수들과 백제 공략에 나선 좌우익 장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런 단서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삼국사기」에는 남천정까지 북상했던 병력의 주요 지휘관이 金庾信, 眞珠, 天存인데, 김유신 휘하 공격제대의 좌·우익 장수는 欽純(흠순)과 品日(품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주 백화산에 진을 치고 예비제대로 대기한 부대의 實兵(실병) 지휘관은 眞珠와 天存이었고, 김유신이 거느린 공격제대의 주력은 品日(품일)과 欽純(흠순)의 부대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신라의 입장에서 멀리 있는 唐과 연합하여 가까운 백제를 치는 것은 병법에서 말하는 遠交近攻(원교근공)이다. 「孫子兵法」에서는 遠交近攻의 전략을 채택할 경우 자국보다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맹국에게 자국까지 먹혀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라의 수뇌부가 이런 兵家(병가)의 상식을 간과했을 리는 없다. 백제를 공략한 당군의 병력 규모가 13만이었으니까 신라 수뇌부도 백제 멸망 후에 전개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蘇烈의 당군에 맞설 만한 병력을 동원했을 것이다. 8년 후(668)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신라가 동원했던 병력의 총 규모가 20만이었던 점과 관련시켜 보면 660년에 동원된 병력의 수가 10만~15만 수준이었다고 판단해도 전혀 무리할 것은 없다.
유리한 地形을 선점하지 못한 까닭
신라군이 고구려를 칠 것처럼 북상했다가 갑자기 창 끝을 백제로 돌렸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왜냐하면 김유신 軍의 진격을 막으러 나온 계백 軍의 규모가 5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만전술이 2백75년 후 고려 태조 王建(왕건)의 후삼국 통일 전쟁에서도 그대로 응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전략적 탁월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서기 935년 王建(왕건)의 고려군은 開京(개경)에서 남하하여 天安(천안)에다 전선사령부를 설치하고 여기서 후백제를 공격하려는 것처럼 陽動(양동)작전을 벌였다. 이에 후백제의 최고 실력자 神劍(신검)은 공주 방면의 금강 계선에 방어군을 집결시켜 고려군과 일대 결전을 전개하려고 했다.
그러나 고려군의 주력은 전격적으로 一利川(일리천:경북 구미시) 방면으로 남하하여 낙동강을 도하하려 했다. 이에 신검은 백제의 방어군을 황급히 낙동강 상류 西岸(서안) 방면으로 돌려 대적했으나, 병력의 열세에다 방어진지조차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참패했다. 이것이 후삼국 통일에 있어 최후의 결전이 된 一利川 전투의 시말이다. 일리천 전투의 패전 후에 신검은 이렇다 할 접전 한번 해보지 못하고 후퇴를 거듭하다가 황산벌에서 그를 추격한 왕건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옥천-탄현-황산벌에 이르는 김유신 軍의 接敵移動路(접적이동로)의 현 위치도 아직 학계의 논란거리다. 김유신 軍이 大田(대전) 밑에 위치한 옥천까지 남하하지 않고 충북 진천에서 백제 영토로 바로 진격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설이 난립해 있지만, 옥천을 공격개시점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다수 의견이다.
鄭永鎬(정영호) 박사의 「김유신의 백제 공격로 연구」에 따르면 신라군은 三年山城(보은군 보은읍 성주리)-山桂里 토성(옥천군 청성면 면사무소 건너편)-장군재(옥천군 청성면 소서리)-구진베루(옥천군 옥천읍 월전리)-郡西(옥천군 군서면)-馬山(마산:충남 금산)-炭峴(탄현)을 거쳐 황산벌로 진출했다. 나는 현지 답사를 통해 정영호 교수의 견해가 史實에 부합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특히 炭峴의 현위치는 연구자들에 따라 구구각색이지만, 완주군 운주면의 西坪里(서평리)와 三巨里(삼거리) 사이에 있는 炭峙(탄치)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다. 탄치라면 임진왜란 때 전라병마절도사 權栗(권율)이 금산으로부터 전주로 침입하려던 왜군을 대파했던 梨峙(이치)와 10리 안팎 거리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이다.
그러니까 김유신 軍은 대둔산(878m)과 천등산(707m) 사이의 골짜기를 타고 오늘날의 충남·전북의 경계 지대인 완주군 운주로 진군한 다음, 여기서 다시 북서쪽으로 진군하여 황산벌로 진출했던 것이다. 그러나 백제의 명장 階伯(계백)은 결단을 늦춘 의자왕의 우유부단 때문에 오늘날의 대둔산도립공원 일대의 전략적 지형을 선점하지 못한 채 가장 불리한 논산평야에서 김유신의 대군과 격돌했던 것이다.
요즘 계백 장군 묘역의 성역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논산시 연산면·부적면 大明山(대명산)에서 판촉사에 이르는 일대가 당시의 격전지로 전해 오는데, 대명산은 산이라기보다 높이 70m 정도에 불과한 구릉이다. 대명산 바로 남쪽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탑정(논산)저수지가 버티고 있지만, 이 저수지는 1941년경에 축조된 것이기 때문에 羅濟의 결전 시기엔 전술적 지형이 될 수 없었다.
계백의 결사 항전
「백제의 옛 터전에 계백의 정기 맑고/관창의 어린 뼈가 지하에 혼연하니/웅장한 호남 무대 높이 우러러 섰고/대한의 건아들이 서로 모인 이곳이/오호! 젊은이들의 자랑 제2훈련소」
대한민국 남정네라면 위의 노랫말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제2훈련소(논산훈련소)의 군가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논산훈련소는 대한민국 육군의 기본병과인 보병 병사의 대부분을 배출했으며, 지금도 국군 최대의 요람이다.
『행군간에 군가 한다. 군가는 제2훈련소 歌(가). 요령은 前(전)과 同(동). 군가 시작. 하낫, 둘, 셋, 넷』
이런 구령이 떨어지면 훈련병들은 목이 터질 듯이 소리치며 논산훈련소의 군가를 불러야 한다. 군가에 이른바 기합이 들어가 있지 않을 경우 인솔 교관이나 조교는 대번에 「원기 부족」이라고 꾸짖으며 반복 또 반복하여 부르도록 다그친다. 그런 탓에 논산훈련소를 거쳐가는 남자라면 6주의 신병 교육 기간중 논산훈련소가를 적어도 골백번은 불러야 한다. 그러니까 논산훈련소가는 한국 남성의 상당수가 일생을 통해 제일 열심히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다.
계백은 백제 최고의 용장이지만, 망해 가는 왕조의 제단에 피를 뿌린 불운한 장수였다. 그는 비록 패장이었지만, 그 패전이 그 자신의 책임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육군의 요람인 논산훈련소의 군가 첫 마디에 계백의 이름을 올린 것은 사려가 부족한 일이다. 국군은 이겨서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계백은 김유신의 5만 대군에 맞서 10분의 1에 불과한 5천의 결사대로 맞서 싸웠다. 출전에 앞서 계백은 자신의 처자를 모두 죽였다. 이것은 계백 스스로도 대세가 이미 기울었음을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다. 「삼국사기」 列傳(열전)에는 다음과 같은 계백의 결단을 기록하고 있다.
『한 나라의 인력으로 당과 신라의 대군을 당하자니, 나라의 존망을 알 수 없다. 나의 처자가 붙잡혀 노비가 될지 모르니 살아서 치욕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통쾌하게 죽는 것이 낫겠다』
조선왕조 太宗 (태종)때의 명신이며 성리학의 대가였던 權近(권근)은 이런 계백의 처사에 대해, 『난폭하고 잔인무도한 짓이며, 오히려 출전하는 사졸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패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라고 낮게 평가했다. 그러나 고려의 遺臣(유신)이면서 조선조를 섬긴 권근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을 것 같다. 계백은 황산벌에 이르러 세 개의 진영을 치고 있다가 김유신 軍이 3路로 공격해 오자 다음과 같이 호령한다.
『옛날 越王(월왕) 句踐(구천)은 5천명의 군사로 吳나라의 70만 대군을 격파했다. 오늘 우리는 마땅히 분발하여 승전함으로써 나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백제군은 드디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다. 이같은 용전분투로 백제군은 서전에서 4번 싸워 4번을 이겼다. 당군과의 합류 기한에 쫓긴 김유신에겐 전선 교착 상태의 돌파구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신라 화랑의 윤리
이때 김유신의 동생이며 右翼(우익) 장군인 흠순이 그의 아들 盤屈(반굴)에게 말한다.
『신하가 되어서는 충성이 제일이고,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가 제일이다. 위태로움에 당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은 충과 효를 兩全(양전)함이다』
世俗五戒(세속5계) 제1항과 제2항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압축시킨 훈계였다. 반굴은 즉각 적진 깊숙이 돌격하여 분전하다가 전사했다. 필사본 「花郞世記(화랑세기)」에 따르면 반굴은 흠순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김유신의 사위다. 국운을 건 전쟁에서 지도층의 자제가 먼저 목숨을 바치는 것이 신라 화랑의 윤리였다.
한국전쟁 때 美 8군사령관 밴플리트의 아들과 毛澤東(모택동)의 외아들은 남의 나라의 최일선에서 전사했지만, 우리 고위층의 자제들 가운데 전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선 신라 화랑의 윤리, 즉 우리 역사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지도층으로 행세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때 신라 지도층의 윤리는 우리 민족사상 가장 모범적이었다.
이번에는 左翼(좌익) 장군 品日(품일)이 결심한다. 그는 아들 官昌(관창)을 불러 말 앞에 세워 놓고 『내 아이는 나이 아직 열여섯이나 志氣(지기)는 자못 용맹하다』고 격동시키고 『오늘 싸움에 있어 네가 능히 三軍의 모범이 되겠느냐?』 라고 묻는다.
관창도 單騎(단기) 돌격을 감행했다. 그러나 그는 곧 백제군에게 생포당하여 계백 앞으로 끌려갔다. 계백이 관창의 투구를 벗겨보고 그의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것을 가상히 여겨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를 살려 보냈다. 관창이 돌아와 품일에게 고한다.
『제가 적진에 들어가서 적장의 목을 베고 軍旗(군기)를 뽑아 오지 못한 것은 죽음이 겁나서가 아닙니다』
세속5계의 제4항 臨戰無退(임전무퇴)를 범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관창은 말을 마치자 손으로 우물물을 떠 마시고, 다시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 날카롭게 싸웠다. 계백이 다시 관창을 붙들자 이번에는 머리를 벤 다음 말안장에 매어 신라 진영으로 보냈다. 품일이 그 수급을 거두자 붉은 피가 흘러 소매를 적셨다. 품일이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얼굴이 살아 있는 것 같구나. 나라 일을 위하여 죽을 수 있었으니 다행이로다!』
우익과 좌익 장군 부자의 언행이 이러했으니까 신라군 모두가 비분강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신라의 대군이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죽기를 각오하고 진격하니 계백과 그의 5천 결사대는 衆寡不敵(중과부적)이었다. 이 전투에서 좌평(백제 16 관등 중 제1위) 忠常(충상), 常永(상영) 등 20여명만 신라군에게 투항하고, 계백을 비롯한 나머지 장병 모두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만약 계백의 죽음이 없었다면 백제 왕조 6백78년의 大尾(대미)는 너무 허망할 뻔했다. 후인들도 계백의 충용을 백제 제1로 꼽았다. 지금 백제 古都(고도) 부여 시가지에 세워져 있는 동상으로는 계백의 동상이 유일한 것이다. 그러나 階伯은 성명이 아니고 複姓(복성)으로서 그 이름은 전해지지 않았다. 역사의 기록은 패장에 대해 불공평하게 대우했던 셈이다.
충상과 상영의 관등이 제1위인 佐平(좌평)인 데 비해 5천 결사대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계백의 관등이 제2위인 達率(달솔)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계백은 자기보다 관등이 한 계단 높은 忠常과 常永 등을 휘하에 거느릴 만큼 출중한 장수였던 것이다. 계백의 전사 후 백제의 저항은 지리멸렬했다.
김유신·소정방의 統帥權 다툼
신라군이 황산벌에 진출했던 7월9일, 唐군은 기벌포에 상륙했다. 기벌포 일대는 개펄 지대로 갈대밭이 우거져 있었다. 당의 육군은 물버드나무 가지와 갈대를 베어다가 개펄과 수렁에 메우면서 진격했는데, 서천군 韓山(한산) 방면에서 백제의 방어군과 조우하여 최초의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백제군은 수천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주했다.
당의 水軍은 때마침 역류하는 밀물을 타고 금강 하류로부터 육군과 병진했다. 백제는 사비성 천도 초기인 동성왕 때 도성에서 12km 떨어진 부여군 임천면 성흥산(높이 270m)에다 加林城(가림성)을 쌓아 都城(도성) 서남 방면의 요새로 삼았다. 가림성에 올라가 보면 視界(시계)가 매우 양호하여 수십리 사방을 관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가림성 일대에 짙은 안개가 끼어 守城軍(수성군)은 당군의 都城 접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전해 온다. 실제 가림성의 수비군은 당군에게 화살 하나 날리지 않고 요충지를 그냥 통과시켰다. 이것은 가림성의 장수가 斥候(척후)도 운용하지 않았을 만큼 용렬했다는 뜻이다.
蘇烈은 가림성 동쪽 세도면에다 휘하 군병을 집결시켜 놓고는 당 고종의 조서를 낭독했다. 백제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던 셈이다. 그 후 이곳의 지명이 頒詔原(반조원)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羅唐 양군은 당초의 계획보다 하루 늦은 7월11일 사비성 외곽에서 합류했다. 소열은 신라군이 약속된 날짜보다 하루 늦게 도착한 것을 꼬투리로 삼아 신라군의 督軍(독군:軍紀장교) 金文潁(김문영)의 목을 벰으로써 김유신의 기를 꺾으려고 했다.
이에 김유신은 황산벌 전투의 상황을 들이대며 김문영을 군법으로 다스리려고 한다면 당군과 먼저 일전을 벌이겠다고 외쳤다. 소열로서는 적전분열까지 불사하겠다는 김유신의 기백에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신라군에 대한 統帥權(통수권)까지 장악하려 했던 소열의 기도가 꺾여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심사는 편치 않았을 것이다.
羅唐 연합군은 의자왕의 도성을 포위하기 위해 소부리벌(충남 부여읍)로 진군하여 의자왕의 도성을 포위한다는 작전을 세웠다. 이 때 소열은 꺼리는 바가 있다며 진격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것은 신라군을 앞세우고 당군이 後軍(후군)이 됨으로써 병력 손실을 피하겠다는 속셈이거나 통수권 다툼에서 밀린 데 대한 공연한 심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蘇定方의 병영 위로 날아다녔다. 사람을 시켜 점치게 했더니, 『반드시 元帥(원수)를 해칠 것입니다』라고 했다. 소정방이 두려워서 싸움을 그치려 하자 김유신이 말하기를, 『어찌 새 한 마리의 괴이한 짓으로써 天時(천시)를 어길 수 있겠소. 天命(천명)에 응하고 인심에 순하여 지극히 어질지 못한 자를 치는 마당에 어찌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겠소?』 라고 했다>
소열로서도 이같은 김유신의 논리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7월12일 羅唐 연합군은 백제의 도성을 향해 네 방향으로 일제히 진격했다. 백제의 수도방위군이 최후의 일전을 벌였지만, 거듭 패전하여 1만여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의자왕은 『成忠(성충)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후회스럽다』 한탄했다.
都城 방어전략의 混線
7월13일 의자왕은 좌우의 측근들을 데리고 밤을 도와 웅진성(충남 공주)으로 도주했다. 羅唐 연합군이 사비성을 포위하자, 의자왕의 둘째 아들 夫餘泰(부여태)가 스스로 왕이라 일컬으며 수성전을 벌이려고 했지만, 왕자와 왕손끼리도 뜻이 맞지 않았다. 왕자 夫餘隆(부여융)이 대좌평 千福(천복) 등과 함께 출성하여 항복했다. 태자 김법민은 부여융을 말 앞에 꿇어 앉히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꾸짖어 말했다.
『예전에 네 아비가 내 누이를 죽여 옥중에 파묻었으니, 나는 이 일로 20년 동안 가슴이 아팠는데, 오늘은 네 목숨이 내 손에 달렸구나!』
부여융은 땅 바닥에 엎드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7월18일 웅진성으로 피난을 갔던 의자왕이 태자 夫餘孝(부여효)와 웅진방면군을 데리고 사비성으로 되돌아와 항복했다. 금돌성에서 의자왕의 항복 소식을 들은 무열왕은 7월29일 소부리성으로 입성했다.
8월2일 羅唐 연합군의 승전 잔치가 벌어졌다. 무열왕과 소열은 여러 장수들과 함께 대청 위에 높이 좌정하고, 의자왕과 그 왕자 등은 마루 아래에 앉히어 의자왕으로 하여금 술잔을 치게 했다. 백제의 여러 신하들 가운데 목 메어 울지 아니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면 「百戰(백전)의 國」 백제가 왜 이렇게 土崩(토붕)의 사태처럼 패망했을까? 우선 都城 방어 전략의 실패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羅唐 연합군의 침공이 개시된 순간에도 백제의 수뇌부는 수도 방어 대책을 둘러싸고 국론의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은 「삼국사기」 의자왕 20년 條의 관련 기록이다.
<의자왕은 군신들을 모아 공격과 수비 중 어느 것이 마땅한지를 물었다. 좌평 義直(의직)이 나서서 말하기를. 『당군은 멀리 바다를 건너 왔습니다. 그들은 물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배를 오래 탄 탓에 분명 피로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상륙하여 사기가 회복되지 못했을 때 급습하면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큰 나라의 도움을 믿기 때문에 만일 당군이 불리해지는 것을 보면 반드시 주저하고 두려워서 감히 빨리 진격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당군과 결전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했다>
해로를 통해 침입하는 적의 가장 취약한 시점은 상륙 전후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의직의 계책은 병법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常永 등이 전혀 다른 계책을 주장한다. 常永이라면 바로 황산벌 전투에서 김유신에게 항복하여 나중에 신라의 관등 7위 일길찬의 벼슬을 받은 사람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常永 등은 좌평 任子(임자)처럼 김유신에게 이미 포섭된 첩자가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
『당군은 멀리서 왔으므로 속전하려 할 것이니 그 서슬을 당할 수 없을 것이며, 신라군은 이전에 여러 번 우리 군에게 패했기 때문에 우리 군의 기세를 보면 겁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계책으로는 당군이 들어오는 길을 막아서 그들이 피곤해지기를 기다리면서, 먼저 일부 군사로 하여금 신라군을 쳐서 예봉을 꺾은 후에 형편을 보아 싸우게 하면 군사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나라를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常永 등은 당군에 대해서는 先守後攻(선수후공)의 전략을 구사하고, 신라군에 대해선 機動防禦(기동방어)로 대응할 것을 건의한 셈이다. 그러나 常永의 헌책은 백제군의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는 비전문가의 탁상공론이었다.
先守後攻의 전략은 수·당의 침략군을 번번이 패퇴시킨 고구려의 상용수법이었다. 그러나 백제의 사비성은 고구려의 평양성과는 달리 방어체계가 빈약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방 1백 리 안에 금강을 제외하면 침략군을 막을 만한 험난한 지형지물도 없었다.
더욱이 백제군의 주력이 신라군과의 전투에 대비하여 동부 국경 지대의 성채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남쪽 금강 하류 방면의 방어 태세는 허술했다. 따라서 금강 하구 지역에 방어 병력을 증강 투입하여 당군의 상륙 작전을 저지하거나 설사 저지엔 실패하더라도 일정한 타격을 가해 당군의 행동을 견제하는 것은 화급을 다투는 일이었다.
어떻든 두 개의 방어 전략이 팽팽하게 맞서자, 의자왕은 주저하면서 어느 말을 따라야할지 몰랐다. 사태가 급박해지고서야 의자왕은 조정에서 쫓겨난 賢臣(현신) 興首(흥수)의 헌책이 아쉬웠다. 이 때 좌평 흥수는 古馬彌知縣(고마미지현:전남 장흥)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다. 의자왕은 急使(급사)를 보내 興首의 견해를 물었다. 興首가 말했다.
『당군은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군율이 엄하고 분명합니다. 더구나 신라와 함께 우리의 앞뒤를 견제하고 있으니 만일 평탄한 벌판과 넓은 들에서 마주하고 대진한다면 승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백강(금강)과 탄현은 우리나라의 요충지로서 한 명의 군사가 창 하나를 가지고도 만 명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니, 마땅히 용사를 선발하여 그곳에 가서 지키게 하여, 당군으로 하여금 백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군으로 하여금 탄현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왕께서는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면서 그들의 물자와 군량이 떨어지고 적군들이 피곤해질 때를 기다린 후 분발하여 급공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흥수의 헌책은 5년 전에 사망한 좌평 成忠의 전략과 비슷했다. 성충은 656년 의자왕의 실정을 간하다가 투옥된 끝에 백강과 탄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서를 남기고 굶어 죽었던 충신이다. 그러나 대신들은 다시 흥수를 중상모략했다.
『흥수는 오랫동안 옥중에 있으면서 임금을 원망하고 애국하지 않았을 것이니, 그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당군으로 하여금 백강으로 들어오게 하여 강의 흐름에 따라 배를 병진하지 못하게 하고, 신라군으로 하여금 탄현에 올라 小路(소로)를 따라 말을 나란히 몰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군사를 풀어 공격하면 마치 닭장에 든 닭이나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드디어 의자왕은 흥수의 계책을 무시하고 機動防禦(기동방어) 전략을 흉내내려 했던 것 같다. 기동방어라면 적을 불리한 지형으로 유인하여 타격을 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대만 전방 방어지역에 배치하고, 주력은 결정적 장소와 시간에 적을 격멸하기 위해 예비대로서 운용하여 과감한 역습을 가하는 전술이다.
계백의 5천 결사대는 예비대가 뒷받침하는 가운데 험난한 지형을 선점해야 기동방어의 實效(실효)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의자왕은 兵家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우유부단의 愚(우)를 범했다. 의자왕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신라군과 당군이 탄현과 금강을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돌파해버렸다.
패망 자초한 백제의 亂政
그럼에도 계백의 5천 결사대는 김유신의 5만 대군을 맞아 초전에 네 번 싸워 네 번 이겼다. 이 때라도 의자왕이 즉각 예비부대만 투입할 수 있었다면 전쟁의 승패는 전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패망기의 백제는 오랜 亂政(난정)에 따른 국가 기강의 해이로 기동방어 전략을 수행할 만한 국가 총동원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백제의 패망을 불러온 亂政의 실상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백제의 말기 증세를 기록하고 있다.
①의자왕 15년(655) 봄, 太子宮(태자궁)을 사치스럽게 수리하고, 왕궁 남쪽에 望海亭(망해정)을 세웠다.
②의자왕 16년(656) 봄, 왕이 궁녀들을 데리고 음란과 향락에 빠져서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좌평 成忠이 적극 말렸더니, 왕이 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었다. 이로 말미암아 감히 간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성충은 옥사에 앞서 왕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 『충신은 죽어도 임금을 잊지 않는 것이니 한 마디 말만 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항상 형세의 변화를 살피건대, 반드시 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무릇 전쟁에는 반드시 지형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 상류에서 적을 맞아야만 군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적군이 오거든 육로로는 탄현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 언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했다.
③의자왕 19년(659) 봄 2월, 여우떼가 궁중으로 들어왔는데, 흰 여우 한 마리가 상좌평의 책상에 앉았다. 여름 4월, 태자궁에서 암탉이 참새와 교미했다(백제 왕실 내부의 치맛바람과 성적 문란을 의미하는 듯함). 가을 8월, 여자의 시체가 生草津(생초진)에 떠올랐는데, 그 길이가 18척이었다(귀족계급 美人의 피살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음). 9월, 대궐 뜰에 있는 홰나무가 사람이 곡하는 것처럼 울었다.
④의자왕 20년(660) 봄 2월, 왕도의 우물이 핏빛으로 변했다. 서해 바닷가에 작은 물고기들이 나와 죽었다. 泗河(사비하)의 물이 핏빛처럼 붉었다. 여름 4월, 王都의 시정인들이 까닭도 없이 놀라 달아나니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1백명이나 되었다(내란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음).
6월, 왕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사람을 시켜 땅을 파게 했다. 석자 가량 파내려 가니 거북이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 그 등에 「百濟同月輪 新羅如月新」(백제동월륜 신라여월신), 즉 백제는 둥근 달과 같고 신라는 초승달과 같다는 글이 쓰여 있었다.
왕이 무당에게 물으니 무당이 답하기를, 『둥근 달은 가득 찬 것이니 가득 차면 기울며, 초승달은 가득 차지 못한 것이니 가득 차지 못하면 점점 차게 된다』고 했다.
이에 왕이 노하여 그를 죽여버리자 측근에서 아첨하기를, 『둥근 달과 같다는 것은 왕성하다는 것이요, 초승달과 같다는 것은 미약한 것입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왕성하여지고, 신라는 쇠약해 간다는 것인가 합니다』고 말하니 왕이 기뻐했다.
위의 「삼국사기」의 기사들은 자연재해 등까지 통치자의 不德(부덕)이나 失政(실정)과 연결시키는 유교적 史觀(사관)에 따른 기록이므로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전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백제의 말기 증세를 보면 왕실과 지도층이 스스로 망하는 수순을 밟았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지도층의 방탕과 사치
백제의 멸망 원인에서 지도층의 방탕과 사치는 다시 한번 짚어볼 대목이다. 백제의 왕실은 이미 武王(600~641) 때부터 華麗浮薄(화려부박)한 풍조에 짙게 물젖기 시작했다. 무왕은 대궐 남쪽에 못을 파서 20여 리 밖에서 물을 끌어들이고, 사면 언덕에 버들을 심고 물 가운데 道敎的 유토피아 方丈仙山(방장선산:중국 三神山의 하나)을 흉내낸 섬을 쌓았다.
<포구의 양쪽 언덕에 기암괴석이 서 있고, 그 사이에 진귀한 화초가 있어 마치 그림과 같았다. 왕이 술을 마시고 몹시 즐거워 하여, 거문고를 켜면서 노래를 부르자 수행한 사람들도 춤을 추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곳을 大王浦(대왕포)라고 불렀다>
무왕은 큰 佛事(불사)도 일으켰다.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우고 그 위에다 거대한 미륵사를 창건했다. 전북 익산에 가서 동양 제일의 위용을 자랑하는 미륵사탑을 보면 불타버린 미륵사가 얼마나 장대한 규모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대대적 토목공사는 백제의 경제를 피폐시켜 민심을 지배층과 유리시켰을 것임에 틀림없다.
백성들은 토탄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의자왕은 657년 봄 정월, 그의 庶王子(서왕자) 41명에게 제1위의 관등인 좌평으로 임명하고 각각 食邑(식읍)까지 내렸다. 식읍이란 국가유공자에게 조세를 거둬 먹게 하는 고을을 말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庶王子들에 대한 의자왕의 특혜는 官等(관등)의 인플레를 일으켜 백제의 6인 佐平 제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稅(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정이었던 것이다.
김유신은 655년 백제의 刀比川城(도비천성)을 공격한 뒤 그동안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백제는 君臣이 사치하고 淫逸(음일)하여 국사를 돌보지 않으매, 백성이 원망하고 神靈(신령)이 노하여 災變怪異(재변괴이)가 여러 번 나타났다』 면서 백제 정벌을 위한 무열왕의 결단을 촉구했다. 당 태종도 654년에 이미 『백제는 바다의 험함만 믿고 機械(기계=병기)를 수선치 아니하고 남녀들이 뒤섞여 연회만 한다』면서 백제를 만만하게 보았다. 이런 인식이 고구려보다 약한 백제부터 멸망시킨다는 羅唐 밀약이 세워지는 단초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의자왕은 자신의 머리 위로 전개되는 국제적 음모에 둔감했다. 652년 이후 백제는 당 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세력 균형의 방책으로 고구려와 왜국을 동맹국으로 삼았다. 그러나 백제의 멸망당하던 순간까지 고구려와 왜국은 아무런 군사 지원을 하지 못했다.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서 패하다
당은 백제 공략에 앞서 658년과 659년에 연이어 요동 지역을 공략함으로써 고구려가 밖으로 눈을 돌릴 수 없도록 견제했다. 왜국은 당시 대규모 호화 토목 공사를 일으킨 여왕 濟明(제명)의 亂政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즉각적으로 개입할 만한 국력을 갖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런 국제 정세에 어두웠던 의자왕은 신라에 대한 공격을 되풀이한다. 백제 멸망 한 해 전(659년 여름 4월)에도 백제군은 신라의 獨山(독산), 桐岑(동잠) 두 성을 침공했다. 이러한 백제의 빈번한 신라 침략은 치밀한 전략 아래 결행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감행되었음을 느끼게 한다. 사실 말기의 백제는 신라에 대해 공세적 위치에 있었지만, 한 번도 결정적 승리를 쟁취한 바가 없었다.
의자왕은 전투에서는 자주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패배했다. 서양의 戰爭史家(전쟁사가)들은 이런 경우를 피루스(Pyrrhus)의 승리라 일컫는다. 古代 에피로스의 王인 피루스는 전투 능력에 관한 한 알렉산더 大王 이래 최고의 강자로 회자되었으나, 너무 잦은 전투로 유능한 장졸들을 소모시킨 끝에 자기 당대에 패망했다. 동양에서는 後漢(후한) 말기의 최대 군벌 董卓(동탁)의 말로가 그러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멸망 당시 백제의 국세는 5部, 37郡, 2백城, 76만戶로 되어 있다. 오랜 전란으로 인해 집집마다 사망자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1호당 가족수를 4인으로 잡더라도 백제의 인구가 3백만에 달했던 것이다. 668년 멸망 당시 고구려의 국세는 5部, 1백76城, 69만 戶로 기록되어 있다. 백제는 고구려에 비해 영토는 훨씬 좁았으나 인구수는 오히려 더 많았던 것이다.
이것은 백제의 농경지가 기름져 농업 생산량이 많고, 그만큼 인구밀도가 높았다는 얘기다. 역사의 기록이 없어 속단할 수 없지만, 농경사회인 삼국 가운데 國富(국부)를 축적하는 데 관한 한 백제가 고구려나 신라보다 훨씬 유리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지배층의 향락 때문에 백제는 부국강병에 실패했던 것이다.
의자왕의 항복 후 당은 백제 땅에 5도독부를 설치했다. 당초 약속을 어기고, 백제에 대한 지배권을 신라에 주지 않고 당의 직할 식민지로 삼았던 것이다.
백제부흥군의 분투
그러나 백제는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었다. 羅唐 연합군의 기습적이며 압도적인 병력 집중으로 사비성은 함락당하고 말았지만, 백제군의 지방군은 건재했던 것이다. 이것은 羅唐 연합군이 백제군의 주력을 포착 섬멸하기 보다는 都城 함락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백제부흥군이 곳곳에서 봉기했다.
무왕의 종질인 福信(복신)과 승려 道琛(도침) 그리고 서부 출신의 黑齒常之(흑치상지)가 任存城(임존성)에서 깃발을 들자, 10여일 사이에 3만여명의 군세가 이뤄졌다. 임존성은 지금의 충남 예산군 대흥면의 봉수산이다. 임존성과 인접한 고마노리성(홍성군 홍성읍 고모리)에서는 달솔 餘自進(여자진)이 궐기했다. 羅唐 연합군은 백제부흥군의 임존성을 공격했으나 패퇴했다.
백제부흥군의 응집력은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도 9월3일 蘇烈의 당군은 본국으로 개선했다. 이 때 의자왕 이하 백제인 1만2천여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다면 백제의 전역이 평정되지 않았는데도 소열이 그렇게 철수를 서두른 까닭은 무엇일까? 고구려 공략을 위한 준비 때문이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정략적 속셈을 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열은 필사적인 백제부흥군과 싸워 보았자 병력의 손실만 초래할 뿐이지 그 자신의 戰功(전공)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소열은 소모전이 불가피한 백제부흥군과의 전투를 신라 쪽에 미뤄버린 셈이다. 사비성·웅진성 지구에는 劉仁願(유인원)의 당병 1만과 무열왕의 아들 金仁泰(김인태)의 7천 병력이 잔류했다.
661년 정초가 되면서 백제부흥군의 세가 더욱 커져 웅진도독부가 설치된 공주와 부여를 계속 공략했다. 웅진의 唐將 유인원은 서라벌에 급보를 띄우고, 신라는 구원군을 급파했다. 3월5일 이찬 品日 휘하의 선발군이 豆陵山城(두릉산성)의 남록에 진을 치려 하다가 백제부흥군의 급습을 받고 참패했다. 두릉산성은 지금의 충남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의 계봉산이다.
3월12일 무열왕의 셋째아들 金文汪, 대아찬 良圖(양도)의 후속 대부대가 달려가 두릉산성을 36일간 공격했지만, 이기지 못하고 철군했다. 이 때 신라의 치중(병참)부대가 백제부흥군의 습격을 받아 막대한 군수품을 탈취당했다. 두릉산성 전투의 승리 후 福信의 부흥군은 지금의 대전 부근까지 진출하여 신라·웅진간의 보급로를 차단했다. 무열왕은 몸소 백제부흥군의 진압에 나서 웅진성의 포위를 풀어야 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