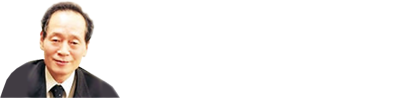정순태의 역사산책
자료실
휴전에 반대한 李承晩 대통령의 반격
鄭淳台 | 2016-08-20 | hit 10660
<P><STRONG>毛澤東이 휴전회담에 응한 까닭</STRONG></P>
<P>미국은 1950년 11월 말에 청천강변과 장진호에서 有史 이래 초유의 대패를 맛보자 ‘북진통일의 정책’을 포기하고 원상복귀 정책, 즉 38선에서의 停戰(정전)을 모색했다.</P>
<P>그러나 승리를 확신한 중공은 정월공세(3차 공세)로 나섰고 37도선까지 쳐내려왔다. 자신감을 상실한 미국은 남한 면적의 3분의 1을 빼앗긴 상태로 전면항복을 의미하는 굴욕적 조건을 받을 각오로 휴전을 제안했다. 만약 군사적 가능성이 없어지면 한국 포기, 즉 미 8군의 일본에의 철수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다.<BR> <BR>하지만 1951년 1월 하순부터 전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중공군의 2월 공세를 격퇴하고 자신을 회복하자, 미국은 不敗(불패)를 믿었지만, 완승할 수 없다는 것도 명확해졌다. 그래서 미국은 체면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의 停戰(정전) 정책을 굳히고 있었다. 그 정책의 단적인 표현이 1951년 4월의 맥아더 파면이었다. </P>
<P>이런 가운데 중공군이 5월 공세를 시작한 것이 5월16일이었다. 敵의 5월 공세를 격퇴한 유엔군은 세 번째로 38선을 넘어 압박을 계속 가하는 것에 의해 毛澤東에게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했다. </P>
<P>반면, 개입 이래 연전연승을 계속해 37도선 부근까지 남하한 중공군은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따라서 유엔 측의 여러 제안을 일축해 정치적 완승을 계속 추구해왔다. 개입 당초 중공의 정치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지만, 군사적 자신이 정치목적을 점차 확대시켰던 것 같다. 단언컨대, 1951년 1월의 시점에서 중공이 全 한반도의 점령을 겨냥했던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유엔 측의 現狀(현상)에서의 정전 요청을 일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P>
<P>그러나 중공의 군사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38선 이남에서의 작전은 병참上 무리였고, 인해전술로는 미국의 과학기술의 벽을 깰 수 없었다. 그 대책으로 중공군은 ▲전선의 후퇴에 의해 보급선을 100km 이상 단축하고 ▲나뭇잎이 무성해 공중 정찰 및 공격으로부터 병력의 은폐가 가능한 시기를 기다린 후 乾坤一擲(건곤일척)의 춘계공세를 감행했다. 그러나 그것도 헛되이 희생을 증가시키는 데 지나지 않았다. </P>
<P>중공도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지지는 않겠지만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다. 수십만 명이라는 人命 손실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얻은 교훈이었다. 이리하여 쌍방은 휴전을 바라는 정책에서 일치했다. 거기에 말리크의 성명이 나와 휴전회담의 계기로 되었던 것이다. </P>
<P>결국, 쌍방이 군사력으로써 해결할 수 없다고 깨달았을 때 처음으로 교섭의 場(장)이 성립된 것이다. 어느 일방의 외교력에 의해 회담이 열린 것은 아니었다. 한쪽이 조금이라도 전세의 유리함을 믿고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기에는 교섭의 場이 열리지 않았다. <BR><BR>더구나 일방이 군사적으로 결정적으로 유리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때는 교섭의 실마리조차 찾아낼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그리하여 상대를 회담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는 결정적 승리를 하든가, 상대에게 이길 수 없다고 믿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P>
<P><BR><STRONG>육군참모총장 교체</STRONG></P>
<DIV class=article_img_l>
<TABLE class=article_img_l border=0>
<TBODY>
<TR>
<TD><IMG class=0 border=0 alt='기사본문 이미지' src='http://chogabje.com/upload/board/editor/thumb_300/2016/08/201681917505676536.jpg' width=300></TD></TR>
<TR>
<TD class=use_caption>이종찬 육군참모총장</TD></TR></TBODY></TABLE></DIV>
<P>말리크의 성명이 있었던 1951년 6월23일,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은 육군참모총장 정일권 소장을 ‘미국 유학’의 명목으로 경질하고, 후임으로 李鍾贊(이종찬) 소장을 임명했다. 丁 장군은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겼다. </P>
<P><FONT face=dotum><당시는 회담을 바라는 미국의 정책 때문에 전선은 고정화하고 있었고, 격동의 1년을 싸워와 心身(심신) 모두 피로했다. 이 무렵, 마침 미국 참모대학 유학의 길이 열렸다. 그런 까닭으로 李 대통령에게 체력이 견딜 수 없음을 호소해 교체를 원했고, 또 밴플리트 8군사령관에게도 미국 유학의 주선을 요청했었다.> </FONT></P>
<P>그 무렵, 체력의 한계에 달한 丁 총장이 졸도하는 일까지 종종 빚어졌다고 한다. 당시의 丁 총장은 미국의 휴전 움직임과 李 대통령의 ‘절대 반대’ 사이에 끼어 運身(운신)의 기력조차 남아 있지 않았던 듯했다. </P>
<P>미군 측의 압력은 “그 무게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 없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연합작전이라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는 筆舌(필설)로 다 할 수 없는 마음고생을 겪어야 했다. 衆望(중망·많은 사람으로부터 받고 있는 신망)을 모아 후임 참모총장에 취임한 이종찬 소장도 재임 1년 여를 뒤돌아보며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겼다.<BR> <BR><FONT face=dotum><참모총장으로서 마음고생은 많았지만, 그것은 군사와 정치와의 接點(접점)에 위치하는 것 때문에 생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정치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휴전회담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李 대통령은, 정치적 제스처로서 나에게 難題(난제)를 꺼내 왔다.<BR> 그러나 유엔군은, 그들의 주장을 李 대통령이 이해해 회담에 반대하지 않을 것을 희망했다. 또 한국군 內에서도 회담 반대파가 있어 매사에 총장에게 要望(요망)하는 바가 많았다.></FONT></P>
<P>이종찬 장군은 휴전 움직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중앙일보사 발간 《민족의 증언》에서 발췌).</P>
<P><FONT face=dotum><살피건대, 리지웨이 장군이 맥아더 원수의 후임으로 되고부터 휴전을 모색하는 듯 보였다. 실은 1951년 5월에 리지웨이 장군이 “이 전쟁에 있어 유엔군의 목적은 적의 전력을 격파하는 것에 있다. 결코 어느 지역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지만, 不可思議(불가사의)하게 느끼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적의 춘계공세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우리 국군의 북진을 억제했던 것은 휴전교섭을 전제로 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BR> 그러나 우리들은 미군 측에 이와 같은 의도가 있으리라고는 알지 못하고 기세를 타고 북으로 쳐올라 갔다. 그래서 상당한 피해를 받은 일조차 있었던 것이다.<BR> 지금 생각하면 휴전회담이 시작되기 수개월 전부터 대규모 기동작전은 중지되었고, 특히 북진은 억제되었다. 이것은 미군이 정치적 거래를 위한 탐색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FONT><BR> <BR>결국, 미국은 한국 측에 이럭저럭 숨기면서 정전의 기운이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셈인데, 이종찬 장군의 회상은 이 같은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P>
<P><BR><STRONG>두 개의 內憂- 국민방위군사건과 거창사건</STRONG></P>
<P>중공군의 개입에 의해 한국은 존망의 갈림길에 서고, 이후 전선에서는 밀고 밀리는 격전이 거듭되다가 드디어는 陣地戰(진지전)으로 이행하지만, 이 기간 후방에서는 여러 가지 內憂(내우·내부에서 발생하는 걱정스러운 사태)가 잇달아 발생했다. </P>
<P>1951년의 1·4 후퇴로 서울시민은 혹한 중에 또다시 피난길에 올랐다. 이때 정부는 40세 이하 장정 60만 명을 징집해서 국민방위군을 편성했다. 전선에의 補充源(보충원)으로, 또 국내의 치안 유지를 위한 시책이었다. 그러나 그 간부 대부분은 대한청년단 소속이었고, 조직은 군대에 준해 구성된 것으로서, 대한청년단 감찰국장인 金潤根(김윤근)이 준장으로 특임되어 사령관으로 보임되었다. </P>
<P>그런데 사건은 1951년 1∼2월에 걸쳐 차츰 명백히 드러났다. 방위대원 중에 아사자와 병사자가 계속 발생했고, 걸인 모습의 대원이 부산 및 대구 등지에 배회했던 것이다. 방위대 간부들이 식비 및 의복비 등의 공금을 횡령한 결과였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횡령금액 중 3분의 1이 정치인에게 상납되고, 3분의 1이 要路(요로)와의 교제비로, 나머지가 유흥비로 탕진되었다는 공판기록이 남아 있다. </P>
<P>국민방위군사건은 여순반란사건 및 表武源·姜太武 대대의 월북사건과 함께 軍內 3大 불상사의 하나로 거론되었다. 표무원과 강태무는 1946년 10월 북한의 평양학원 대남반 1기로 졸업한 후 월남하여 육군사관학교 2기생으로 입교해 국군에 침투해 소령까지 진급한 자들이다. </P>
<P>여순반란사건(1948년 10월9일) 이후 남로당 핵심간부들이 연이어 연행되자, 불안을 느낀 제8연대 1대대장 표무원(춘천 주둔)과 제2대대장 강태무(홍천 주둔)가 1949년 5월4일 각각 대대 병력을 이끌고 월북한 사건을 말한다. 표무원과 강태무는 북한군과 사전에 내통해 진지 보강 등을 이유로 38선에 접근해 북한군에게 급습·포위당하자, 대대 장병들에게 항복할 것을 강요했다. 이에 반발한 부대원들은 북한군과 교전해 100여 명이 전사하고 382명이 복귀했다. </P>
<P>다시 국민방위군사건. 金鍾甲(김종갑) 준장이 국방부 방위국장에 취임하자, 당시의 부국장 金炯一(김형일) 대령이 먼저 “방위대 간부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김형일 대령은 김종갑 장군이 제8연대를 창설했을 때의 중대장이었던 관계로 이런 조언을 했던 것이다.<BR><BR>김종갑 준장은 사정은 잘 모른 채 의아하게만 생각했는데, 곧 방위대 간부가 사과 상자 하나를 가지고 왔다. 大邱(대구)는 사과의 명산지였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전투의 피로를 풀라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받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폐가 가득 들어 있어서, 즉각 되돌려 보냈다고 한다. 軍 수뇌부에서도 내막을 모르고 금메달 등을 받았다가 나중에 망신한 사례도 있었다. </P>
<DIV class=article_img_l>
<TABLE class=article_img_l border=0>
<TBODY>
<TR>
<TD><IMG class=1 border=1 alt='기사본문 이미지' src='http://chogabje.com/upload/board/editor/2016/08/201681917525941538.jpg' width=269></TD></TR>
<TR>
<TD class=use_caption>국민방위군 총살 장면</TD></TR></TBODY></TABLE></DIV>
<P>방위대 간부 다섯 명은 8월 중순에 총살형에 처해졌지만, 국민의 불신을 씻기는 어려웠다. 총살 전, 김윤근은 “나는 정치도 군사도 모르는 씨름꾼이었지만, 뜻밖에 중책을 맡아 터무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자격이 없는 자가 중책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후회했다. 이 사건으로 1951년 5월 초 申性謨(신성모) 국방장관, 趙炳玉(조병옥) 내무장관, 金俊淵(김준연) 법무장관이 파면되었다. </P>
<P>김윤근(1900∼1951)은 1928년 이후 전국씨름대회에서 여덟 차례 우승했던 인물이다. 8·15 광복 이후 여운형의 건국치안대에서 활동했고, 신성모 총리와의 인연으로 대한청년단 감찰국장이 되고 육군 준장으로 특임되었으나 청년단과 軍 경력은 전무했다. </P>
<P>1951년 2월6일에는 거창사건이 일어났다. 경남 거창군 神院面 菰亭里(신원면 고정리)라는 공비 출몰지구에서 군에 협력하던 청년대와 경찰대가 공비의 습격으로 몰살당했다. 그래서 지구 담당 제11사단 제9연대의 일부가 양민 수백 명을 ‘通敵分子(통적분자)’라고 살해했던 것이다.<BR> <BR>게릴라 토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게릴라와 良民(양민)의 구별이다. 따라서 거창사건은 군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하는 불상사가 아닐 수 없었다. 12월16일의 공개재판을 통해 연대장 이하의 직접 책임자가 처벌되었지만, 심각한 內憂가 아닐 수 없었다. 휴전회담이 시작되기 직전에 참모총장에 취임했던 이종찬 장군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BR> <BR><FONT face=dotum><운이 나쁜 시기에 총장을 맡았다. 1년간에 걸친 기동작전이 陣地戰(진지전)으로 이행했던 직전의 일이고, 회담은 迂餘曲折(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장기화했다. 이런 때 마음이 해이해지면 諸惡(제악·전체 惡)이 터져 나올 듯한 느낌이었다. <BR> 그래서 본래는 총장의 부수적인 일인 재판에까지 신경을 써야할 형편이었다. 국민방위군사건, 거창사건, 徐珉濠(서민호) 의원 사건, 정치파동 등이 잇달아 일어나 그 처리에 바빴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이것들은 모두 정치가 개입된 문제였다. 단순히 軍令(군령)만으로 다룰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었던 것이다. 매일 매일이 법과 인간, 정치와 軍事(군사) 사이에 낀 것이었다. 군인을 그만 두려고 하는 생각도 자주 했다.></FONT></P>
<P>위에서 언급된 서민호 사건은 反이승만派의 선봉이었던 서민호 국회의원(무소속)이 1952년 4월, 자택에 침입한 徐昌善(서창선) 소위를 호신용 권총으로 사살한 행위를 말한다. 徐 의원은 同年 7월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복역 중 1960년 4·19 혁명으로 특사되었다. </P>
<P><BR><STRONG>휴전에 반대한 李 대통령의 반격</STRONG></P>
<P>1951년 6월23일 휴전회담과 관련한 말리크 성명과 다음날인 24일의 중공의 贊意(찬의)는 바로 세계의 전파를 탔다. 하지만 한국에 ‘정전의 정책’이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 이틀이나 지나서였다. </P>
<P>6월26일 16시경, 서울로 날아온 리지웨이 대장은 밴플리트 사령관 및 무초 대사를 대동하고 李 대통령을 방문, “워싱턴의 지령에 따라 말리크 제안을 수락해 휴전교섭에 응하려 한다”는 뜻을 담담하게 통고했다. 동석했던 측근들의 말에 의하면 “李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묵묵히 리지웨이의 통고를 들었다”고 한다. </P>
<P>그러나 李 대통령은 이틀 후인 6월28일부터 반격을 시작했다. 명확하게 회담 개최를 반대하고, 이 시기에서의 통일을 세계의 여론에 호소했다. 2년 17일 동안 계속된 정전회담 기간 중 무수하게 발표된 반대 성명 중 제1호였다. 제2호는 卞榮泰(변영태) 외무장관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P>
<P><FONT face=dotum><전쟁에 관한 대한민국의 태도를 명확히 해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무리하게 정전에 반대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전의 조건을 명시하여 공산주의자의 모략 및 술책에 빠질 위험성을 제거하려고 한다. 다음 다섯 가지 항목을 정전 조건의 기초로 한다면 교섭에 응할 용의가 있다. <BR> <STRONG>①</STRONG> 중공군은 만주로 철퇴한다. …북한의 非전투원 및 재산에 危害(위해) 및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BR><STRONG> ②</STRONG> 북한 괴뢰군은 무장을 해제한다. <BR><STRONG> ③ </STRONG>유엔은 제3국이 북한공산당에게 군사, 재정, 기타 어떠한 형식의 원조도 부여하지 않게 하는 조취를 취한다. <BR><STRONG> ④ </STRONG>한국은, 한국문제에 대한 전부 혹은 일부를 토의하는 국제회의 및 회담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중앙일보사 발간 《민족의 증언》에서 인용) </FONT><BR> <BR>위의 조건은 북한에게 사실상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북한이 이 조건을 삼킬 리는 없었다. 이 성명이 겨냥했던 것은 회담의 저지와 북진 작전의 계속을 호소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당시 문교부 장관 白樂濬(백낙준·연세대 총장 역임) 박사는 당시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중앙일보사 발간 《민족의 증언》에서 발췌) <BR> <BR><FONT face=dotum><당초, 정부는 사태를 예의주시해 가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미국은 회담 방식과 개최일자 등을 일체 비밀로 하고, 한국 정부에는 전혀 알려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예고도 없이, 쌍방의 군사령관 간에 정전회담을 열고, 휴전한다고 하는 회담방식을 발표했다.<BR> 이와 같은 미국의 공식태도가 발표되자, 국무회의에서 다시 정부의 대책을 협의했다. 그 회의에서는 李 대통령이 이미 결정하고 있었던 ‘절대 반대’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투쟁방법만을 논의했다고 기억한다. 결국, 휴전의 찬부를 논의했던 것은 아니고, 반대의 실천방책을 토의했을 뿐이었다. <BR> 李 대통령은 즉시 반대성명을 발표, 북진통일을 주장했다. 물론 정략적 차원이 다분히 가미된 것이었다. 한국 정부의 태도가 너무도 강경했던 것이어서, 미국의 要人(요인)이 잇달아 설득하러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李 대통령에게 설득당해 돌아갔다. <BR> 李 박사는 한국인 전부가 휴전에 반대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 궐기대회라든가 데모를 지도했다. 그런 까닭으로 학생 데모가 1952년 여름 절정에 달했다. 또 軍에서도 절대 반대하도록 지령했다. 그러나 국군의 작전지휘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었다. 따라서 국군은 움직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BR><BR></FONT>당시 유엔대사 林炳稷(임병직·외무부 장관)씨는 국제무대에서의 반대활동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BR> <BR><FONT face=dotum><1951년 6월23일, 문제의 말리크 제안이 나오자, 본국으로부터 “말리크 제안을 거절하도록 각국 대표를 설득하라”는 訓令(훈령)을 받았다. 李 대통령의 지령은 “전세는 유리하다. 소련의 제안은 이미 숨이 끊어질 듯한 적에게 시간의 여유를 주기 위한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반대하도록 설득하라”라고 하는 것이 主旨(주지)였다. <BR> 그러나 참전 16개국은 이미 소련의 제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특히 미국과 영국은 바로 휴전하려고 하는 태도였다. 1년 전에 침략자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했던 유엔의 분위기는 싹 변해 있었던 것이다. <BR> 미국 대표 W. 오스틴 등과 여러 번 만나서 설득했지만, 그 대답은 “워싱턴의 정책은 이미 휴전으로 결정되어 있다. 세계의 추세, 특히 美蘇 관계로 보아 세력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어느 쪽이 완승을 거두면 위험을 확대할 뿐이다. 따라서 무승부로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였다. <BR> 결국 “전쟁을 다시 계속 확대하면 核전쟁으로 발전할 두려움이 많다. 따라서 現狀(현상)에서 戰火(전화)를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논리였다. <BR> 나는 참전국 대표 전부를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하고, 유엔 총회 및 정치위원회 등에서 몇 번이나 휴전에 반대하고, “전쟁에서 宥和(유화)정책을 취할 것이 아니고, 강대국이 약소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더욱이 전세는 유리한데, 왜 휴전하려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BR> 그러나 미국은 소련에 대한 고려와 영국의 압력 때문에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 영국의 태도는 실로 不유쾌했다. 중공이 개입하자, 영국은 매사 워싱턴에 압력을 넣었다. 영국의 기본정책은, 군사적으로 미국이 아시아에서 발이 묶이지 않도록 해서 유럽 優先(우선)으로 돌아가자는 것, 경제적으로는 중공과의 무역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었다. > </FONT></P>
<P>당시 청와대 비서관 尹錫五(윤석오) 씨는 그가 목격한 李 대통령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P>
<P><FONT face=dotum><대통령의 근본적 입장은 절대 반대였다. 하지만, 실제 李 대통령의 북진통일 노선은 맥아더 원수의 해임과 함께 허구로 되었던 것이다. <BR> 李 대통령이 미국의 장성들 중에서 존경했던 것은 맥아더 원수 뿐이었다. 두 분의 정치노선은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李 박사는 희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맥아더 원수는 해임되었다. 그때 李 박사의 실망과 낙담은 보기에 딱할 정도였다. 아마 내심으로는 북진통일을 체념한 것이 아니었을까? ></FONT></P>
<P><STRONG><BR>휴전회담에서 소외된 당사국</STRONG></P>
<P>“통일 없는 휴전은 절대 반대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이 무시된 채 유엔군 측은 휴전회담을 조속히 타결하여 전쟁의 확대를 막기 위한 협상을 진행시키려 했다. 반면 공산 측은 휴전회담 기간을 통해 陣地(진지) 보강과 전력 증강을 꾀하면서 한반도의 적화전략을 추구하려고 했다.<BR> <BR>1951년 7월10일부터 개성의 來鳳莊(내봉장)에서 군사회담 제1회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유엔 측의 수석대표는 조이 미 극동해군사령관, 대표는 미 8군 참모부장 호디스 소장, 미 극동공군 부사령관 그레이기 소장, 버크 제독, 한국군 대표는 제1군단장 백선엽 소장이었다. 공산 측의 수석대표는 북한군 총참모장 南日(남일) 중장, 북한군대표는 李相朝(이상조) 소장과 張平山(장평산) 소장, 중공군 대표는 부사령원 鄧華(등화)와 정치위원 解方(해방)이었다. </P>
<P>그에 앞서 7월6일, 유엔군사령부로부터 육군본부에 “휴전회담 대표로서 2人을 차출하고 싶다. 1人은 백선엽 장군을 희망한다. 다른 1人은 영어나 중국어에 능통하면 좋겠다”는 통지가 날아왔다. 이종찬 총장은 이 뜻을 白 소장에게 전화로 알리고, 다른 1인은 총장 보좌관 李壽榮(이수영) 중령을 지명했다. 李 중령은 치밀할 뿐만 아니라 영어 능력도 발군인 人材(인재)였다.<BR><BR>李 총장은 李 중령에게 “白 장군을 잘 보좌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자료를 수집해 수시로 정부에 보고하라”고 지령했다. 결국,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 것인지에 관한 한 한국은 사실상 圈外(권외)에 있었던 셈이다. 李起鵬(이기붕) 국방장관과 李 총장은 경무대로 올라가 2인의 대표를 차출하게 된 경위를 보고했다.</P>
<P>휴전교섭 예비회담이 7월8일에 열리고, 7월10일에는 제1회 본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은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러나 한국은 유엔군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 당시의 육본 정보국장 金宗勉(김종면) 준장은 그 소외감과 초조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P>
<P><FONT face=dotum><국방부 및 육본은 臺詞(대사)도 잘 들리지 않은 뒷자리 客席(객석)으로 물러나 앉은 느낌이었다. 유엔군사령부 및 미 8군으로부터는 아무런 통보도 오지 않았다. 따라서 外信(외신)에 의해 군사정전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정도였다. 어떤 순서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교섭하는 것인가, 알 수 없었다. 그때의 고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FONT><BR> <BR>그래서 7월10일, 이기붕 국방장관과 이종찬·孫元一(손원일)·金貞烈(김정렬) 등 3군 참모총장이 서울로 날아왔다. 목적은 국군대표 백선엽 소장으로부터 회담의 내용을 듣는 것이었다. </P>
<P>우선, 일행은 미 8군사령관 밴플리트 대장을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백선엽 소장의 現 위치를 물었지만, “그것은 本官(본관)의 권한 밖이다”며 가르쳐 주지 않았다. 회담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나는 전혀 모른다”는 매몰찬 거절이었다. </P>
<P>후에 들은 얘기지만, 회담은 워싱턴의 지시를 받던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이 직접 대표단에게 지령하고 있었다. 따라서 밴플리트 대장도 실은 휴전회담에 관한 한 소외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행은 입장이 매우 곤란해졌다. 국내 기자들이 수행하고 있었지만, 뭐라 설명할 자료도 없었던 것이다. </P>
<P>거기서 지혜를 짜낸 끝에 육본 정보국장 김종면 준장이 혼자 無斷(무단)으로 休戰(휴전)회담의 대표들이 머물던 汶山(문산)의 ‘평화촌’에 잠입해 백선엽 소장의 얘기를 듣기로 했다. 金 준장은 별판을 단 지프를 타고 평화촌으로 달려갔다. 경계는 매우 엄중했지만, 미군 헌병은 차에 星版(성판·장군 계급의 별을 단 군용차의 표지판)을 때문인지,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시켰다. </P>
<P>그런 金 준장을 발견한 白 소장이 반가운 나머지 포옹을 하면서 “어찌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물었다. 7월10일 제1회 정식회담이 열린 직후였다. 金 준장은 사정을 설명하고 “회담 내용을 조금이라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자, 白 소장은 “모든 것을 비밀로 되어 있다. 어려운 입장이다. 조이 수석대표와 얘기해 보겠다. 내일 또 와달라”며 고민의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P>
<P>김종면 준장이 다음날인 11일 방문하자, 이수영 중령의 통역으로 미군 대령이 회담의 진행상황을 브리핑해 주었다. 이것이 회담 내용에 대한 최초의 통보다. 이에 따라 金 준장이 미군 대령으로부터 브리핑 받은 내용은, 그날의 석간신문부터 보도되기 시작했다. </P>
<P>그리고 白 소장의 주선으로 다음날인 12일에 李 장관과 3군 참모총장이 평화촌을 방문했고, 이후 金 준장이 매일 평화촌에 가서 대변인 역할을 했다. </P>
<P>이에 대해 김종면 장군은 “白 장군의 노력으로 이와 같은 채널이 공식화되었다. 白 장군이 수석대표인 조이 제독을 설득해 이와 같은 형식을 만들었던 것이다. 유엔군 측은 白 소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白 장군의 요청을 물리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소경이 코끼리를 더듬고 있었던 시기”에 처음으로 보도 채널을 확보할 수 있었다. </P>
<P>또 다음의 일화도 있었다. 이종찬 참모총장은 휴전 대표로 부임하기 직전의 白 소장에게 국사 책 한 권을 선물한 바 있었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사적인 회담대표로서 “子子孫孫(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배워라”는 의미였다고 한다. 이종찬 장군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P>
<P><FONT face=dotum><그때 회담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도록 유도할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白 장군을 방문했던 것이다. <BR> 지프로 汶山(문산)으로 가던 중 도중에 우리 일동은 “북진의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38선과 大同小異(대동소이)한 분단 상태에서 휴전하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피를 흘린 보람이 없지 않은가!”라고 통탄했다. 우리의 신의에 배신하는 맹방의 행위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다. <BR>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이것이 참으로 약소민족의 비극이라고 개탄하고, 모두 흐느끼는 마음으로 문산에 도착했다. <BR> 회의가 없는 날이어서 문산 평화촌의 사과밭 안 텐트에서 白 장군을 만났다. 만나서 기뻤지만, 白 장군은 국군의 대표라는 책임감과 회의의 주도권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 사이에 끼어 매우 고뇌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점심을 함께 하면서 위로했다. <BR> 조이 제독을 만났을 때는 우리 정부의 뜻을 명확히 전했다. 공산 측의 시간 벌기 술책에 넘어가지 말 것을 요청했다…. 백선엽 장군은 “솔직히 말해서 대표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니다. 교섭의 방침 및 회담의 흥정은 모두 워싱턴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FONT> </P>
<P><BR><STRONG>‘회담장을 開城에 설치한다</STRONG><STRONG>’</STRONG><STRONG>에 동의한 유엔군의 오산 </STRONG></P>
<DIV class=article_img_l>
<TABLE class=article_img_l border=0>
<TBODY>
<TR>
<TD><IMG class=0 border=0 alt='기사본문 이미지' src='http://chogabje.com/upload/board/editor/thumb_300/2016/08/201681917544016542.jpg' width=300></TD></TR>
<TR>
<TD class=use_caption>남일.ن.25 전쟁 당시에는 요직에 앉아 활동했으나 <BR>1960년대 6.25전쟁의 책임을 물어 제거되었다.</TD></TR></TBODY></TABLE></DIV>
<P>제1차 회담에 임한 白 대표는, 공산 측 수석대표 南日의 억지에 혐오감을 느꼈고, 그가 동포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 남일은 소련 태생으로 소련에서 성장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얼굴은 한민족처럼 보였지만, 속은 소련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사실, 그는 소련의 이익 대변인이었다. </P>
<P>또 회담석상에서 白 대표의 맞은편에 앉은 북한 대표 張平山(소장)은 “요것 보라”는 듯이 메모지에 “미국의 走狗(주구)는 喪家(상가)의 개만도 못하다”라고 써서 들이밀었다. 白 대표는 그를 꾸짖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회담장에서 발언권은 수석대표 1인 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상대는 공산주의의 탈을 쓴 꼭두각시이지, 인간의 품성은 아니었다. </P>
<P>군사회담의 장소에 대해 유엔군 측은 당초 元山(원산) 앞바다에 정박하고 있었던 덴마크의 病院船(병원선)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이것을 거부하고, 開城(개성)을 제안, 회담을 서둔 유엔군 측이 이에 동의했다. </P>
<P>유엔군 측에 있어 이것은 뼈아픈 오산이었다. 개성은 공산군 측의 점령 지역으로, 그들은 회담 진행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서고 여러 가지 선전효과를 얻기 위해 그곳을 고집했던 것이다.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뒤에서 再論(재론)할 것이다. </P>
<P>유엔 측은 빠르면 2주, 늦어도 4주 정도면 휴전협정의 조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회담은 첫날부터 공산군 측의 고의적인 지연전술 때문에 휴전협정 의제 채택은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 교섭의 행방에 따라 前線(전선)에서의 작전도 춤을 췄다. </P>
<P>이와 같이 휴전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양측은 휴전협상 자체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전면공세는 자제하면서도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제한공격에 주력했다. 유엔군은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타개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공산군에 휴전조건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했다. </P>
<P>반면 공산군은 휴전협상 과정에서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력증강을 도모하고, 일부 빼앗긴 진지를 탈환하는 등 군사력 과시를 통한 휴전회담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전투를 강행했다. </P>
<P>유엔군은 협상 중에도 제한된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 적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고지 쟁탈전을 택했다. 공산군 역시 유엔군 진지 가운데 돌출되어 있거나 취약한 진지에 대해 공격을 가하는 등 고지 쟁탈전을 전개했다. </P>
<P>결국, 쌍방 모두 휴전협상 타결 후 생길 군사분계선(MDL)을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지쟁탈전을 전개했다. 군사분계선이란 교전국 사이에 휴전이 성립되었을 때 그어지는 군사행동상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리하여 쌍방에 있어 결코 손해가 적지 않는 陣地戰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교섭이 지루하게 지속되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형태를 달리한 전쟁이었다. </P>
<P>교섭은, 회담에 대한 쌍방의 기본적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 회담을 유엔 측은 ‘현재의 군사정세를 기초로 한 구체적 휴전 교섭의 場’으로 생각했던 데 반해 공산군 측은 “군사행동을 통해 얻지 못한 것을 교섭을 통해 획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P>
<P>이로 인해 무엇을 회담의 議題(의제)로 할 것인가를 놓고서 처음부터 난항, 7월26일에 이르러서야 다음의 다섯 개 항목을 의제로 한다는 데 겨우 합의했다.<BR><FONT face=dotum> <BR>① 議題(의제)의 채택<BR>② 비무장지대의 설정과 군사경계선의 확정<BR>③ 停戰(정전)과 休戰(휴전)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결정<BR>④ 포로에 대한 결정<BR>⑤ 쌍방의 각국 정부에 대한 권고</FONT></P>
<P>의제의 채택에 이어 제2의제인 군사경계선에 관한 토의에 들어갔지만, 교섭은 즉각 暗礁(암초)에 부딪쳤다. 그래서 1951년 8월22일, 공산 측은 유엔 공군기가 개성 上空(상공)을 침범했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교섭의 중단을 선언하고, 회담장으로부터 철수했다. <BR><BR>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회담장소를 공산군 측의 주장대로 개성으로 결정한 것은 유엔군 측이 범한 최대의 失策(실책)이었다. 6·25 남침전쟁 전에 한국 땅이었던 개성이 휴전회담 당시에는 공산 측의 지배지역이었다. 회담장 때문에 개성의 수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BR><BR>또 회담장이 비무장지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장한 공산군 병사들의 모습도 자주 보였다. 회담의 취재도 공산 측 기자로 한정되어 있었고, 이것을 철회시키는 일조차 여러 날이 걸릴 정도였다. <BR><BR>결국 휴전회담은 유엔군 측이 개최를 서둘렀던 만큼 느긋한 공산군 측의 페이스로 진행되었다. 특히, 개성 지역에서 작전행동을 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서울 방어에 不可缺(불가결)한 예성강 유역 일대를 국군과 유엔군이 탈환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BR><BR>그 후 2년 동안, 중동부에서는 전선의 변화가 無常(무상)했지만, 개성-판문점 지역에서는 작전이 벌어지지 않고, 現狀(현상)의 線으로 휴전을 맞았던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개성시 뿐만 아니라 개풍군·연백군·옹진군 등이 38선 이남임에도 수복하지 못했다. 수도 서울은 現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50km다. 최소한 예성강 하류 線을 탈환하지 않은 한 서울의 방어는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 <BR><BR>이렇게 군사회담 장소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당시 유엔군 측은 휴전만을 서둘렀지, 서울의 안전보장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강과 임진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함에 따라 한강과 임진강을 半身不隨(반신불수)의 강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강의 物流(물류)가 통하려면 적어도 禮成江(예성강)까지는 탈환했어야 했다. 예성강도 북한의 개성과 延安(연안) 사이를 흘러내려와 남한의 김포반도·강화도 북쪽을 흐르는 한강 하류에서 합류하고 있다 . <BR><BR>이런 상황에 대한 無知(무지) 때문인지,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을 만나 서울 방어에 긴요한’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하려는 듯한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BR><BR>“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뀌어야 합니다.”<BR>“그것(NLL을 지칭)이 국제법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BR>“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P>
<P>NLL(북방한계선)은 휴전 당시 유엔군과 공산군의 실력을 반영한 線(선)이었다. 당시 유엔군 측은 制海權(제해권)을 장악했던 만큼 38선 이남의 接敵(접적)지역 영토 가운데 일부인 서해5島를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것에 기인한 NLL은 상식적·논리적 근거가 충분한 것이다. 예컨대, 터키 西部(서부)해안에 바짝 붙어 산재한 섬들은 대부분 역사적 해운·해군국인 그리스의 영토가 되어 있다. <BR><BR>노무현은 대통령 재임 당시 김정일에게 ‘북한의 변호인’ 노릇을 해왔다고 公言(공언)했다. 그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무 수행이 아니라 국가 반역행위였다. 다음은 역사의 웃음거리가 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다. <BR><BR>“나는 지난 5년 동안 北核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 <STRONG>(계속)</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