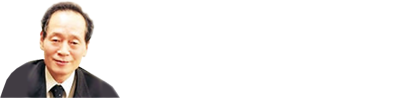정순태의 역사산책
자료실
중공군과 ‘停戰(정전)을 해야 한다’는 국제 여론이 일자 고민에 빠진 美國
鄭淳台 | 2016-06-29 | hit 9394
중국 통일제국의 常用수법을 답습
중공군은 1950년 12월31일 제3차 공세를 발동해, 일시 서울을 점령하고 37도선까지 南下했지만, 중공군의 기본전술은 이미 한계에 이르고 말았다.    
| ||
미 8군은 38선을 따라 엷은 방어진을 구성했을 뿐이지만, 중공군은 38선 북쪽에서 잠시 정지하고 있었다. 유엔은, 중공이 개입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교섭을 잘 하면 평화가 오는 것 아닌가 하고 잔뜩 기대했다. 그러나 중공군의 38선에서의 정지는 순전히 兵站上(병참상)의 이유 때문이었고, 이미 다음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유엔군은 이때 중공군의 병력을 27만6000명, 북한군(남한 소재 빨치산 포함)을 16만7000명, 이를 합산한 병력을 약 44만3000명으로 추정했다. 그밖에 중국의 東北3省(동북3성·滿洲)에 대기하고 있는 병력이 65만 명, 中國 본토로부터 東北으로 이동 중인 병력이 25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한편 한국군과 유엔군의 총 병력은 36만 명. 그러나 전투병은 한국군 14만 명, 미국 10만 명을 합해 모두 24만 명으로 劣勢(열세)였다. 다만, 유엔군 측은 절대적인 制空權(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현대 군사학에서는 제공권 대신에 航空優勢(항공우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전쟁 당시엔 제공권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더 잘 어울렸다.
 |
| 중공군 1~3차 공세 당시의 전투 상황도 |
1950년 12월31일, 중공군은 主攻(주공)을 서울 정면으로 指向(지향)하고, 全 전선에 걸쳐 제3차 공세(1950년 12월31일∼1951년 1월15일)를 개시했다. 주공(Main attack)이란 결정적인 목표에 대부분의 공격역량을 집중 지향하는 전술집단을 말한다.
 
“삘릴리리∼∼ 쾡 쾡 쾡…”
징치고 나팔 불면서 돌격해, 수류탄을 던졌다. 지뢰밭이나 철조망은 무시하고 온몸으로 계속 부딪쳐 오는 人命輕視(인명경시)의 전법이었다.
 
毛澤東은 國共內戰(국공내전) 과정에서 투항해 중공군에 편입된 수백 만 명의 옛 國府軍(국부군)을 한국전쟁에서 ‘가능한 한 消費(소비)’할 작정인 듯했다. 중국의 역대 통일제국은 국내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으레 패망한 前 왕조의 병력을 대량 처리하려고 對外(대외)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隋煬帝(수양제)와 唐太宗(당태종)의 고구려 침략, 그리고 쿠빌라이칸의 日本(일본) 정벌 등이 모두 그러했다. 
쓰러져도 또 쓰러져도 파도처럼 몰려오는 중공군의 돌격에 의해 국군과 유엔군은 곳곳에서 분단·포위되어 잇달아 붕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戰線(전선) 중앙의 산악지대에 대한 북한군의 진격이 재빨랐다.
1950년 12월31일은 유난히 춥던 일요일이었다. 어둠이 일찍 찾아든 17시경 서부전선에 배치된 중공군과 북한군은 짧은 공격 준비사격과 함께 압도적으로 우세한 병력을 투입해 일제히 공격해 왔다.
그로부터, 20만 명에 가까운 대병력이 투입된 서부전선의 계곡과 능선은 중공군으로 덮히게 되었다. 중공군은 汶山(문산) 우측의 제1사단과 동두천의 제6사단 등 국군부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제1·제6사단은 준비된 진지에서 용전분투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는 중공군의 人海戰術(인해전술)에 버틸 수 없었다.
해가 바뀐 1951년 1월1일 오전, 국군 제1·제6사단 지역에 커다란 돌파구가 형성되었다.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국군과 유엔군이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지체할 경우 주력이 중공군에게 포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위기를 직감한 리지웨이는 全 부대를 한강∼양평∼홍천을 잇는 선으로 철수했으며, 이어  평택∼안성을 연결하는 선으로 물러났다.
미 8군은 부산까지의 지역에 ① 38도선 ② 한강 南岸(남안) ③ 平澤(평택)∼三陟(삼척) ④ 錦江(금강) ⑤ 洛東江(낙동강) 등 5개의 방어선을 설정, 이 진지에서 공산군 측의 出血(출혈)을 강요하고, 마침내는 攻勢移轉(공세이전)을 실행하기로 결의했던 것이다. 공세이전(Counter Offensive)이란 敵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방어로부터 적극적인 공세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반격과 동의어이다.
1951년 1월4일, 국군과 유엔군은 또 다시 후퇴, 서울을 포기했다(1·4 후퇴). 국군과 유엔군이 철수하자, 그 뒤를 따라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하면서 중앙청·서울시청 등 곳곳에 또다시 인공기가 펄럭이기 시작했다. 리지웨이 8군사령관이 한강선 방어를 포기하고 조기 철수를 명령한 것은 한강이 두터운 얼음으로 뒤덮혀 있어 중공군의 도하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공군 역시 그동안의 전투력 손실과 보급의 제한으로 인해 더 이상 공세를 펼치지는 못했다. 이 기간 중 전국적으로 약 764만 명의 피난민이 엄동설한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고통의 시간은 계속됐다. 유엔군의 전략이 한반도에서의 철수인지, 再반격인지, 분명치 않은 가운데 후퇴는 계속되었다. 유엔군은 平澤(평택)∼丹陽(단양)∼三陟(삼척)을 연결하는 37도선에서 겨우 전선을 유지했다. 유엔군이 37도선까지 물러난 것은 1951년 1월6일이었다.
도와주는 측의 한계
“당초의 정치적 목적은 전쟁의 經過(경과)에 따라 자주 변화하고, 마침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이란 것은 전쟁의 과거 결과 및 장래 전망에 의해 좌우되게 마련이다.”
프로이센의 군사사상가 클라우제비츠(1780∼1831)는 그의 《戰爭論(전쟁론)》에서 위와 같이 갈파했다. 거칠게 말하면 “이기면 정치적 목적이 팽창하고, 지면 목적, 그 자체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일에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도와주는 측에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의 목적 완수에 ‘올인’을 하는 일은 없다.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었다.
원래,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을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해 참전을 결단했다. 그리하여 仁川상륙이라는 쇼킹한 작전을 계기로 守勢(수세)에서 공세로 移轉(이전)해 “한국에 침입한 북한군을 물리치고, 한국의 평화를 회복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일단 달성했다. 
그러나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민의 다수는 북진통일을 열망했다. 유엔 및 미국에서도 여러 논란은 있었지만, 이 시점에서 유엔은 ‘이 지역’을 보통의 한국인들처럼 ‘한반도 全域(전역)’으로 해석, 북진통일을 승인했던 것이었다. 결국 한국의 의지와 미국의 의지, 즉 도와주는 측과 도움을 받는 측의 목적이 일치했던 시기였다.
다만, 북진통일에 대해 李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라고 생각했던 반면, 미국 측은 “소련과 중공이 개입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이 무렵, 중공은 “유엔군이 북진하면 개입하겠다”는 뜻을 여러 경로로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다음과 같이 오판했다.
“중공은 이미 개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周恩來(주은래) 외상의 聲明(성명)은 정치적 위협일 뿐이다. 설사, 개입하더라도 그것은 공군력으로 격파 가능하다. 건국 1년도 되지 않은 중공이 본토를 공습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개입할 리 없다.”
중공의 高자세
       
1950년 10월25일에 모습을 드러낸 중공군은 11월5일에는 제8군을 청천강 지역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미 제1군단과 한국군 제2군단으로 이뤄진 제8군은 하마터면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했지만, 바로 다음 날인 11월6일 중공군이 거짓말처럼 제1선에서 싹 자취를 감추었다. 사실, 이것이 그들의 제1차 공세의 종료였던 것으로서, 그 공세의 목적은 主力의 집중을 엄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이것을 대규모 공세의 예고로 판단한 西유럽 참전국들, 특히 중공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던 영국은, 중공의 개입 목적을 “① 미국과의 직접 대치를 회피하기 위한 완충지대의 설정 ② 압록강 水豊(수풍)발전소 전력시설의 안전 확보 등에 있다고 판단, 중공에 대해 停戰(정전) 의지를 타진했다. 물론,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고 난 다음의 움직임이었다.
이는 중공군의 제1차 공세에 의해 압록강∼두만강까지 평정해 한반도의 완전 통일을 기한다는 미국의 정치목적에서 일보 후퇴를 의미했던 것이다. 중공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북진했던 것이니 만큼 그 전제가 무너진 이상, 목적의 축소는 당연의 귀결이었다. 그러나 중공의 반응은 없었다. 
당시 맥아더와 워싱턴은, 중공군의 병력을 7만 명 정도의 지원병 혹은 조선족 출신 병사로 추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차 공세로부터 받은 충격에서 벗어난 미국은 다시 ‘한반도의 완전 통일’이라는 정치목적으로 복귀해, 11월24일에 크리스마스 공세를 發起(발기)했던 것이다. “크리스마스까지 전쟁을 끝낸다”는 맥아더의 성명에 의거해 매스컴이 붙인 作戰名(작전명)이었음은 앞에서 썼다.
그런데 중공은 바로 그 다음날인 11월25일부터 제2차 공세를 개시했다. 유엔군이 7만 명 안팎이라고 추산했던 중공군의 제1선 병력은 실로 30개 사단, 30만 대군이었다. 서부 전선에서 미 제8군의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동부 전선의 장진호반에 진출해 있던 미 제1해병사단은 12개 사단의 중공군에 의해 포위되었다.
그러나 완승을 추구한 맥아더는 아직 공세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국군 제2군단 사령부를 방문한 워커 8군사령관은 劉載興(유재흥) 군단장에게 공격의 續行(속행)을 지시했다. 劉 군단장이 “무리”라고 답변하자, 워커는 “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맥아더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되려 하소연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병력의 격차를 극복하기 어려웠다. 중공의 대군이 곳곳에 침투해 퇴로를 차단하고 포위했다. 미군 사상 초유의 패전을 맛본 맥아더는 한반도에서 가장 폭이 좁은 평양∼원산 선으로 물러날 것을 지령했지만, 이 방어선도 중공군에게 先取(선취)당해 버렸다. 제8군은 38선으로의 후퇴를 下令(하령)했다.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절망감에 휩싸여 고향 평양을 뒤로 했다. 후퇴 도중에 多富洞(다부동) 전투 때의 전우인 마이켈리스 미 제27연대장을 조우한 김에,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은 어쩔 작정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마이 켈리스 대령은, “모른다. 만일의 경우 오키나와(沖繩)나 괌으로 물러나야 하겠지. 걱정해도 방법이 없다”고 대답했다.
미 제8군은 12월15일을 전후해 38선 남쪽으로 퇴각했다. 2주 남짓 만에 300km나 후퇴했다. 쇼크를 받은 투르먼 대통령이 원폭의 사용을 넌지시 암시해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12월1일의 일이었고,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은 12월17일이었다.
1950년 12월 중순, 38선으로 후퇴한 제8군은 새로 편성된 한국군 제3군단(군단장 李亨根 소장)을 휘하에 넣어 엷은 방어막을 치고 있었다. 국군 제3군단은 제2, 제5, 제9사단 등으로 이루어졌다. 동부전선의 미 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은 흥남—함흥 지구에서 포위되었다. 결국 유엔군은 兩分(양분)되었다. 따라서 중공군이 그대로 남하하면 부산 공략은 용이할 것으로 보였다. 이때가 유엔군의 최대 위기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계속해 밀고 내려오지 못했다. 병참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38선의 북에서는 중공의 大軍이 법석을 떨고 있었지만, 실은 탄환도 다 소비하고, 배도 고픈 형편이었다.
중공의 개입 목적을 “북한 정권의 회복 및 북한이라는 완충지역 확보”에 있는 것으로 오해한 유엔은, 미국의 了解(요해)아래 現狀(현상)에서의 停戰(정전)을 모색했다. 印度(인도)가 중공과 幕後(막후) 접촉을 하고, 유엔에 초청했던 중공 대표 伍修權(오수권)에게 現 상태에서의 停戰(정전)을 제의했다.    
‘現 상태에서의 정전’이라 함은 38도선을 경계로 하는 휴전을 이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엔군이 일거에 스스로 38선까지 후퇴했던 것은 앞에서 그것에 대한 예측이 있었던 때문인 것으로 비쳤다. 결국, 북한의 군사력을 격멸하여 한반도 통일을 이룩한다는 목적은 자연 소멸되고, 38선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물러났던 것이다.
이때 미국은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 그것은 트루먼 대통령과 애틀리 영국 수상의 회담 내용이 뒷받침하고 있었다. 미국은 더 이상 전쟁을 확대하지 않고, 完勝(완승)을 구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던 것이다. 승리에 도취해 있던 中共의 요구는 강경했다. 당시, 오수권 대표가 유엔에 제시했던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① 유엔군의 즉시 완전 철퇴
 ② 臺灣(대만)에의 불간섭
 ③ 중공의 유엔 즉시 가입 
     
사실상 무조건 항복 요구였다. 이겼다고 믿은 측이 中途(중도)에서 전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미국과 西유럽 국가들의 외교노력도 불리한 戰勢(전세) 아래에서는 단 한 푼의 가치가 없었던 셈이다. 
美, “불명예스럽지만 37도선에서 버틸 수만 있다면…”
12월24∼25일경부터 동부 산악지대에서 북한군의 침투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12월31일 밤, 北京 정부는 유엔의 和平 제안을 걷어차는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냈다. 중공의 대군이 38선 남쪽으로 눈사태처럼 쏟아져 들어온 것이었다. 이른바 정월공세(1951년)였다.
교통사고로 전사한 워커 대장을 대신해 제8군사령관에 취임한 리지웨이 중장은 최대의 저항을 시도하면서도 1월4일에는 또다시 서울을 포기했다. 그리고 1월 중순에 간신히 미 제10군단을 투입해 평택∼제천∼삼척의 선(37도선)에 방어선을 쳤다. 1·4 후퇴였다.
이때 미국의 전략방침은 중공군이 계속 남하하면 금강 → 소백산맥 → 낙동강線으로 후퇴하면서 공산군에 견디기 어려운 손해를 가해 停戰으로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군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제8군을 일본으로 철수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워싱턴은 그 철퇴 시기의 판단을 맥아더에 일임했다.
이때 미국은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했지만, 그들의 체면 때문에 군사적 가능성이 全無(전무)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었다. 거기엔 당초의 전쟁목적도 없고, 한국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의도 없었다.
그러나 1951년 1월10일 경부터 공산군의 공세가 갑자기 수그러들었다. 이것을 차기 공세의 준비라고 본 西유럽 諸國(제국)은 講和(강화)의 충동에 휩싸였다. 유엔에 제출된 정전결의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았다.
 ① 현상에서의 즉시 정전
     → 이 경우 휴전선은 북위 37도선 안팎
 ② 휴전 간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기한다
     → 구체안은 제시되지 않았음
 ③ 외국군은 적당한 단계를 거쳐 철퇴한다
     →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조기 철퇴의 뉘앙스를 풍김
 ④ 대만 문제와 중공의 유엔 가입 문제는 미·영·중·소 4대국이 협의한다
     →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
 
네 개의 조건부였지만, 이것은 전면적인 항복 표명과 다를 바 없었다. 西유럽 여러 나라는 이처럼 한국을 버리는 형태의 조건에서 타협해서라도 미국의 힘을 西유럽으로 돌리고 싶었던 것이다.
미국은 고민했다. 西유럽의 협력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왔음을 자각하며 분함을 삭히고 이 결의안에 동의했다. 힘이 다해 싸우다가 부산에서 내쫓기는 것보다는 불명예스럽기는 하나 北緯(북위) 37도선에서 버틸 수만 있다면, 이게 낫다고 하는 實質(실질)을 취하려 했던 것이었다. 군사력의 부족을 외교로써 보완하려는 정책의 발로였지만, 이 조건은 당시 미국이 동의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생각되었다. 
국제정치에는 산타클로스가 없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면 이것이 도와주는 측의 한계였다. 미국은 기습을 받은 한국을 돕기 위해 원군을 투입했다. 일단은 성공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중공의 개입이라는 예측 못한 사태가 발생하자, 병력 부족이 현저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西유럽 국가들의 권고에 의해 미국의 군사력 행사는 자제되었다. 만주는 聖域(성역)이 되었고, 중공 본토에 대한 무력행사는 禁忌視(금기시)되었다.
이리하여 미국은 패배의 일보 직전에 몰려 한국의 포기, 즉 미군의 일본 철수를 결의하려 했다. 왜냐하면 西유럽의 離反(이반)을 각오하면서까지 전쟁을 확대하고, 미국인의 피를 더 이상 흘리며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미국을 제3차 대전으로 끌어들이는 두려움도 있어, 미국의 국익에 배치되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도와주는 측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거듭 말하지만, 국제정치에서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주는 ‘산타클로스’는 없다고 해도 좋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1951년 1월, 유엔과 미국의 정전 정책에 따르면 한국의 행정구역이 서울을 포함해 3분의 1 축소되는 것이었고, 만약의 경우는 한국의 멸망 또는 제2의 臺灣化(대만화)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에겐 이보다 더 큰 재앙은 없었다.
그러나 이 정책 결정의 과정에 있어 한국에게는 한마디의 상담도, 단 한 번의 통지도 없었다. 이에 대해 정일권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긴 바 있다(佐佐木春隆의 《조선전쟁—韓國篇》 인용) .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부산교두보의 위기 때만큼 걱정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리지웨이 8군사령관의 결의를 알고 있었다. 그가 부임 인사차 李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開口一聲(개구일성)은 “나는 한국에 최후까지 남아서 버티기 위해 왔다”는 것이었다. 또 적의 兵站(병참) 능력으로 미루어보아 더 이상 남하는 어렵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의 양해를 받지 않고 그 生死存亡(생사존망)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정일권 총장의 증언도 결과론을 부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단언컨대, 조약이나 공약이 있다고 남이 자신의 위험도 돌아보지 않고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희망사항이다. 앞으로도 그렇다. 도와주는 측은 도와주는 것이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고, 도와주는 정치효과와 치러야할 희생이 균형을 이룬다고 하는 판단 아래 도와주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공약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스탈린은 일찍이 “조약은 깨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라고 갈파한 바 있다. 그렇다면 도움을 받는 측은 그 나름의 준비와 각오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준비와 각오가 필요한 시기에 돌입하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