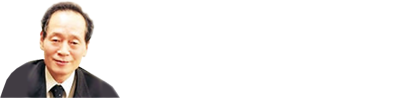[편집자 注] 國寶는 나라의 보배다.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으로서 寶物보다 한 단계가 높은 최상급의 有形文化財다. 그 대상은 木造 건축, 石造物, 典籍,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등 다양하다. 國寶와 寶物은 국가가 지정한다. 현재까지 지정된 國寶는 모두 304개에 달한다.
그러면 어떤 有形文化財가 國寶로 지정되는가? 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그 시대를 대표하며, 제작 기술이 뛰어나고, 형태·품질·용도가 특이하며,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깊은 것 등이 國寶로 선택될 수 있다. 여기에 필자가 國寶를 취재하면서 느낀 소감 하나를 덧붙인다면 國寶의 공통점은 그것이 그 자체로서 일종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國寶를 알아야 민족의 正體性을 세우고, 나라를 사랑하게 되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자신 있게 개척할 수 있다. 月刊朝鮮은 이번 호부터 國寶 기행을 싣기로 했다.
국보 제1호 崇禮門(속칭 南大門)
조선 초기 건물을 대표하고 임진왜란 때 불타지 않은 유일한 서울의 城門
國威의 상징 南大門의 歷史
崇禮門(숭례문)은 南大門의 정식 칭호다.
南大門은 바로 동쪽에 서울 最古最大(최고최대)의 재래시장인 南大門市場(남대문시장)을 끼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外來(외래) 관광객들 중 84.7%가 서울을 다녀가고, 서울 방문 外來 관광객들 가운데 절반 이상(50.5%)이 南大門市場을 한 번씩은 찾는다(한국관광공사의 2000년 실태조사). 하루 24시간 내내 잠 자지 않고 不夜城(불야성)을 이루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南大門市場이다. 여기서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의 살 냄새」를 맡으며 쇼핑도 하고 南大門도 만난다. 바로 이런 점에서 南大門은 세계인들에게 제시한 한국의 상징이다.
따라서 國寶(국보) 기행은 한국의 상징물이자 국보 제1호인 崇禮門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당연할 것 같다. 필자는 속칭 南大門으로 더 잘 알려진 崇禮門을 시나브로 조우하는 위치에서 수십년 간 밥벌이를 해 왔지만, 실은 그 역사적·예술적 眞價(진가)를 잘 모른 채 건성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나 필자가 國寶 기행을 하기로 작심하고 눈을 부릅뜨고 다시 보니 崇禮門은 그냥 한 눈으로 흘기고 지나갈 건축물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남아 있는 성문 중에서 최대 규모이며, 건축양식 면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구조물이다.
崇禮門은 漢城都城(한성도성)의 4大門 중에서도 서열 제1위인 正門이었다. 따라서 이 大門은 외국인이라면 그 신분이 使臣(사신)일지라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國威(국위)의 현장이었다. 그래서 女眞(여진)의 사신은 반드시 東小門(동소문)만을 통해 도성에 들어올 수 있었고, 倭國(왜국)의 사신은 시체나 빠져나가 水口門(수구문)이라 불렸던 光熙門(광희문·중구 광희동)만 통과할 수 있었다.
조선은 壬辰倭亂(임진왜란)이 끝난 후 히데요시(秀吉) 집안을 패망시키고 성립된 도쿠가와(德川) 幕府(막부)의 왜국과 국교가 재개되었지만, 왜국 사신에 대해선 都城(도성) 출입까지 봉쇄했다. 왜국 사신은 都城에서 1000리나 떨어진 釜山浦(부산포)의 草梁倭館(초량왜관)에 머물면서 우리 禮曹(예조)의 통제를 받는 東萊府使(동래부사)나 그 下官인 倭學訓導(왜학훈도:종9품관)와 외교교섭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金大中 정부 하에서 우리의 主敵(주적)인 북한의 선박들이 사전통보도 없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멋대로 침범하게 하는 일과 조선왕조의 사례를 대비하면 우리 국민으로선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自古로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 주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가치가 없다.
조선시대 木造건물의 모델
崇禮門의 예술적 가치를 거론하자면 책 한 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다. 木造(목조)건축 전문가들은 『숭례문은 전형적인 多包(다포) 양식으로서 그 구조의 견실함이 자랑거리』라고 입을 모은다. 도대체 多包가 뭔가? 多包를 알려면 우선 우리 木造 건물의 핵심 부분인 木共包(공포)부터 이해해야 한다.
좀 거칠게 말하면 木共包는 기와지붕 바로 밑 쪽에 닭벼슬처럼 쭈뼛쭈뼛하게 돌출한 구조물을 말한다. 木共包에는 화려한 단청까지 칠해져 매우 현란한 모습이다. 그래서 그 고유 기능보다 美觀(미관)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기와지붕은 대단히 무겁다. 木共包는 이런 무거운 기와지붕을 떠받치는 力學的(역학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高麗(고려) 시대에는 대체로 기둥들의 바로 윗부분에만 木共包를 설치했다. 이런 木造 건축물을 柱心包(주심포) 집이라고 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柱心包만으로는 지붕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麗末鮮初(여말선초)에 이르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木共包를 끼워 넣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多包 양식이다. 崇禮門은 多包집 양식을 충실히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崇禮門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은 太祖 5년(1396) 1월 도성을 쌓을 때부터다. 석축과 문루 등의 건설은 기술과 시일을 요하는 것이었던 만큼 太祖 7년 2월8일에 완공되었다.
太祖 때 건설된 崇禮門은 世宗 15년(1433)부터 改築(개축)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 이유는 崇禮門이 기울거나 퇴락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당시 崇禮門의 改築 필요성에 대해 世宗은 영의정 黃喜(황희), 좌의정 孟思誠(맹사성) 등 세 정승을 불러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景福宮(경복궁) 오른 팔의 山勢(산세)가 낮고 확 트여서 껴안는 형국이 아닌 까닭에 南大門 밖에 못을 파고 門 안에 支天寺(지천사)를 세운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南大門이 저렇게 낮은 것은 처음에 땅을 파서 편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 땅을 높게 돋우어서 산맥에 연하게 하고 그 위에 문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世宗이 개축하려 하니 反論 거세
그러나 南大門의 개축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大臣들은 모두 찬성했으나 司憲府(사헌부)와 司諫院(사간원)의 젊은 관원들이 대번에 『아니 올시다』라고 들고 일어났다. 반대의 이유는 太祖 이래 궁궐을 짓는다, 都城을 쌓는다, 淸溪川(청계천) 다리를 놓는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이미 많은 부역을 부과한 만큼 「이제는 좀 쉬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南大門 개축공사는 뒤로 미루어져 15년 후인 世宗 29년(1447) 8월에야 착공되었다. 조선왕조 최고의 治績(치적)을 올린 世宗大王이지만, 오늘날 帝王的(제왕적) 대통령과는 달리 獨斷獨走(독단독주)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南大門 하나를 개축하기 위해 신하들의 동의를 얻는 데 15년 간의 세월이 걸렸던 것이다.
世宗 30년 5월에 완공된 이 공사는 좌참찬(종1품 벼슬) 鄭(정분)이 담당했다. 기존의 南大門을 완전히 헐어내고 바닥을 높게 돋우어 양쪽 산맥에 연결시킨 다음 그 위에 새로 石門을 쌓고 門樓(문루)를 건축했으므로 補修(보수)나 重修(중수)가 아닌 완전한 개축이었다.
필자는 바로 이 대목에서 世宗 임금의 天才的 藝術性(예술성)을 발견했다. 땅을 돋우고 基壇(기단)까지 높직이 쌓아 그 위에다 문루를 올려 놓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南大門의 모습이 날아갈 듯 훤칠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南大門 건축방식은 조선왕조 건축물의 모범이 되었다.
중국 北京 紫禁城(북경 자금성)의 정문인 午門(오문) 같은 것은 규모만 장대할 뿐 서울 南大門처럼 훤칠하지 않다. 일본 奈良(나라)의 東大寺(도다이지) 같은 것도 옆으로 펑퍼짐하게 벌어져 둔중한 느낌을 준다. 잦은 지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모른다.
南大門은 애시당초 높직한 基壇 위에 올라 있는 데다 기와지붕의 線(선)이 봄 바람에 휘날리는 여성의 치마처럼 끝자락에서 상큼한 곡선을 이루면서 하늘로 치솟고 있다. 지붕은 겹치마, 각 추녀마루에는 龍頭(용두)와 雜像(잡상)이 놓이고, 용마루 끝에는 鷲頭(취두:수리의 머리)가 조각되어 있다.
양녕大君이 쓴 「崇禮門」
건물의 평면은 아래 위층 모두가 정면 5間, 측면 2間이며, 건물 내부의 아래층 바닥은 홍예문(무지개 모양의 문)의 윗면인 중앙칸만이 우물마루일 뿐 다른 칸은 흙바닥으로 되어 있고, 위층은 널마루이다.
문루 2층에 붙어 있는 編額(편액)에서도 만만찮은 필력을 느낄 수 있다. 「芝峰類說」(지봉유설)에 따르면 편액 「崇禮門」을 쓴 사람은 世宗의 큰형인 讓寧大君(양녕대군)이다. 다른 門의 편액이 가로로 쓰인 것과 달리 세로로 쓰인 것은 崇禮의 두 글자가 불꽃을 의미하며 景福宮을 마주보는 冠岳山(관악산)의 불기운을 누르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 후 32년이 지난 成宗 9년(1478)에 이르러 南大門이 옆으로 조금 기울어졌다. 흙으로 높게 돋우었던 남대문의 기반이 침하했기 때문이었다. 南大門의 改作공사는 다음 해 5월경에 완공되었다. 世宗 때의 건축 모델을 그대로 따랐다.
건축구조는 성벽보다 일단 높게 화강석으로 陸橋(육교)를 만들어 城路(성로)를 잇고, 그 아래로 홍예(아치)를 틀음으로써 대문을 내고 장방형 육교 上面에 重層樓(중층루)를 세워 완성했다. 건물 주위에는 여장(凹凸 모양의 성가퀴)이 쌓였고, 그 좌우 측면의 한쪽으로는 각기 통용문이 개설되었으며 여장 內로 떨어지는 빗물 등은 石漏槽(석루조)를 통해 모두 排水(배수)되게 되었다. 개작된 南大門은 이로부터 1961년까지 약 500년 간 존속했다.
1961년 보수공사는 5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풍화작용 등으로 석재와 목재가 부숴지거나 썩은 것이 적지 않아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썩은 석재와 목재 이외에는 모두 옛날 자재를 그대로 사용하여 옛 설계 그대로 복원한 것이다. 이때 여러 가지 銘文(명문)이 발견되고 古丹靑文樣(고단청문양)이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崇禮門은 당초 八作지붕(사람 人자 모양의 지붕)이었던 것이 후에 현재의 우진각지붕(용마루에서 추녀마루가 合角 없이 바로 내려온 지붕 모습)으로 고쳐졌음이 밝혀졌다. 1997년 12월 보수공사에서는 문루의 기왓장 등이 대폭 교체되었다.
가토 軍이 통과한 門
崇禮門은 경복궁·창덕궁·창경궁 등 궁궐과 관아가 깡그리 불탄 임진왜란 때도 피해가 없었다. 宣祖(선조) 임금이 평안도로 피난한 가운데 왜군의 2번대인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부대는 1592년 5월2일 南大門을 통해 도성에 입성했다. 이후 왜군은 1년 간 서울을 점령했다.
丙子胡亂(병자호란·1636) 때는 仁祖 임금이 강화도로 피난가기 위해 南大門을 빠져나오다가 淸軍(청군)의 선봉이 길을 끊고 있다는 급보를 받고 南大門 문루에 올라 선후책을 강구한 끝에 光熙門을 통해 南漢山城(남한산성)으로 들어가 농성했다. 이후 淸軍은 약 50일 간 都城을 점령했지만 南大門은 온전했다.
崇禮門의 모습이 가장 크게 훼손된 것은 1907년부터이다. 그때 崇禮門의 서쪽에 연결되어 있던 성벽이 헐리기 시작하여 그 자리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崇禮門은 양날개를 잃어버린 나비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 1907년 8월1일 해산 명령에 격분한 조선군 시위대가 봉기하자 日本軍은 南大門 문루에다 기관총을 거치해 놓고 시위대가 주둔해 있던 西小門(서소문) 병영을 향해 집중사격을 가하기도 했다.
그래도 1940년경에 찍은 사진을 보면 南大門 주변은 오히려 한가했다. 전차 하나가 南大門 서쪽을 돌아가는 가운데 고관대작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세단차 4대와 경호차 1대가 지금의 태평로 쪽을 향해 달리고 있다. 이밖에는 남대문 홍예를 통과하는 사람, 차도에서 서성이는 사람들, 우마차와 마부들 등이 눈에 뜨일 따름이다.
오늘날 南大門 주위는 대한화재빌딩, 국제화재빌딩, 서울상공회의소, 대경빌딩, 삼성생명빌딩 등 고층건물이 둘러싸고 있다. 그 바람에 「國寶 제1호」는 왜소화되어 그 위상에 흠집을 내고 있다. 통행 인구와 자동차가 엄청 폭증한 가운데 南大門은 國寶 제1호로서의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발등에 떨어진 화급한 문제다.
접근로도 없어 孤島가 되다
지금 南大門은 자동차 매연 공해에 찌들어 가고 있다. 崇禮門을 취재하면서 한 시간도 못 되어 필자는 심한 재채기를 했다. 구경꾼이 國寶 1호에 다가갈 수 있는 접근로도 없다. 「포토 포트」(사진 찍는 장소)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교통 방해물」이란 이유로 무산되었다. 이것은 國寶 제1호가 사람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세계 어느 나라에 랭킹 1위의 國寶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취객들 중에는 차도를 무단 횡단하여 南大門 문루에 올라가 잠자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고 한다. 南大門을 관리하는 서울 중구청의 담당자에 따르면 IMF 사태 이후 「집 없는 아저씨들」까지 이곳에 「보금자리」를 트는 바람에 화재라도 발생할새라 國寶 1호를 지키기 위해 비상이 걸리고 있다.
崇禮門의 가치는 조선 초기의 건축물을 대표한다는 데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시대적인 가치이고, 또 하나는 건축사적 가치이다. 前者는 서울에만도 大小 성문들이 있으나 그 문루가 모두 임진왜란 이후의 것으로서 조선 초기의 것으로선 崇禮門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後者는 開城 南大門(개성 남대문)에서 이루지 못한 多包집 城門의 표본을 崇禮門에서 개화시켰기 때문이다. 崇禮門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것은 국민적 숙제이다.
국보 제2호 圓覺寺 터 10층 석탑
「王權 찬탈」 世祖의 고뇌와 눈물이 배어 있는 異色的인 탑
우리 역사상 技巧 랭킹 제1위의 석탑
기교면에서 朝鮮朝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이색적인 석탑이라면 단연 圓覺寺(원각사) 터(탑골공원) 10층탑이다. 지번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번지 1호. 이 석탑의 모든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全面에 가득 찬 우아한 조각이 石材의 회백색과 어우러져 그리스의 8등신 女神像(조각상)처럼 늘씬하다.
각 층의 塔身(탑신)에는 하단부에 괴임대가 높직하게 마련되어 있고, 측면에는 난간을 模刻(모각)했다. 塔身石(탑신석)의 모든 면을 부처, 보살, 天人(천인)을 돋을 새김(陽刻)으로 장식했고, 네 귀퉁이에도 圓形(원형)의 돌기둥을 새겨두고 있다.
屋蓋石(옥개석:지붕)은 사람 人자 모양의 八作지붕이며, 下面에 枓木共(두공:건물 기둥 위에 올린 구조)을 입체적으로 새겨 넣었다. 지붕의 개와골도 모두 목조건물의 지붕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특히 2층 정면의 지붕은 殿閣(전각) 지붕과도 같으며, 3층은 2重의 지붕 모양을 하고 있어 그 솜씨가 놀랍다.
지금은 10층 옥개석까지만 남아 있고, 그 위의 相輪部(상륜부:탑의 꼭대기에 있는 가느다란 철재 또는 석재 장식 부문)는 없어졌다. 상부의 8, 9, 10층 탑신과 옥개석이 무너져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을 1947년 본래 모습대로 복원했다. 이로 미루어 상륜부가 사라진 것은 오래 전의 일이었던 것 같다.
이 석탑의 소속 사원이었던 圓覺寺는 조선 世祖 12년(1466)에 창건되었다. 따라서 이 10층 석탑도 사찰 창건 당시의 건조물로 짐작된다. 필자가 이 석탑을 만날 때마다 궁금한 것은 排佛崇儒(배불숭유)를 國是(국시)로 삼은 조선왕조에서 어떻게 都城 한복판에다 큰 절을 짓고 이같은 예술적 석탑을 세우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遺物 속에 스며 있는 世祖의 王權과 눈물
조선조 초기의 임금들은 겉으로야 어떠했던 불교를 그리 미워하지는 않았다. 太祖는 無學대사를 王師(왕사)로 삼았고, 世宗은 한글로 쓰인 「釋譜詳節」(석보상절) 등 佛書(불서) 간행에 열심이었다. 前代(전대)인 고려시대의 유풍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世祖는 불교에 깊이 귀의하여 전국의 명찰을 순례했다. 圓覺寺 터 10층 석탑의 건립은 이런 世祖의 후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그렇다면 높이 12m의 巨塔(거탑)을 세운 世祖의 심경은 무엇이었을까. 어린 조카 端宗(단종)과 친동생 둘까지 죽이고 임금 자리를 찬탈했던 世祖, 그도 인간적으로는 엄청나게 고뇌했을 것이다. 결국 악성 피부병(나병이라는 說도 있음)으로 그는 오랫동안 신음했다.
世祖는 그의 병을 기도로써도 씻기 어려운 자신의 罪行(죄행)에 대한 業報(업보)라고 느끼며 눈을 감았을지도 모른다. 재위 14년 만이었다. 필자는 화려무비한 圓覺寺 터 10층 석탑으로부터 世祖의 유별나게 강력했던 王權(왕권) 속에 內在한 「눈물의 흔적」도 느끼고 있다.
이런 圓覺寺와 그 10층 석탑은 드디어 못 볼 것을 보고 만다. 世祖의 死後 승려의 都城 출입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世祖의 증손자로서 왕위에 오른 희대의 플레이보이 燕山君(연산군)은 그의 할머니 인수대비를 헤딩을 하여 죽이고, 圓覺寺를 기생들의 놀이터로 용도를 변경했다. 燕山君은 反正으로 쫓겨나지만, 이후에도 圓覺寺와 그 10층 석탑은 역사의 그늘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圓覺寺의 폐허는 뜻밖에도 노랑머리의 서양인에 의해 팔자를 고친다. 光武 1년(1897)에 총세무사이던 영국人 브라운의 건의에 따라 圓覺寺 터는 서울 최초의 근대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이후 이곳은 탑골공원 또는 파고다 공원으로 불리게 되었다.
1919년 3·1운동 당시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고, 모여있던 학생 약 4000명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2만여 명의 시민들도 합세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가행진을 했다. 그래서 광복 이후 이곳은 독립운동의 聖地(성지)가 되었다.
현재 이 공원 안에는 國寶 제2호인 10층 석탑 이외에 보물 제3호인 大圓覺寺碑(대원각사비)가 있다. 10층 석탑은 풍우와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유리집으로 씌워져 있다. 요즘 탑골공원은 境內 보수 공사 때문에 폐쇄되어 있다. 10층 석탑 주위에 모여 앉아 우국충정을 털어놓던 할아버지들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실까?
국보 제3호 北漢山 신라 진흥왕 巡狩碑
신라의 漢江 유역 점령을 증언하는 역사적 遺物
碑峰에서 느낌으로 다가온 역사의 파노라마
인구 1000만명의 메트로폴리탄 서울이 北漢山(북한산)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名山을 끼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다. 그러나 北漢山은 도시인의 휴식공간이나 등산코스에 그치는 곳이 아니다. 서울의 鎭山(진산)인 이곳은 우리 역사의 핵심 토막을 안고 있다. 그 대표적 현장이 碑峰(비봉:556m) 정상에 있는 眞興王 巡狩碑(진흥왕 순수비)다.
진흥왕 순수비는 1970년대에 비바람에 의한 마멸을 피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안 지하 2층 전시실에 옮겨다 놓았지만, 원래의 위치인 碑峰에 올라야 이 빗돌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碑峰은 북한산 僧伽寺(승가사) 바로 뒤의 바위산이다. 구기동 매표소에서 출발하면 승가사까지가 1.4km인데, 碑峰은 승가사 앞에서 표지판을 따라 860m만 더 오르면 된다. 비봉매표소나 승가매표소에서 출발하면 지름길로 오를 수 있지만, 그 만큼 가파르고 아기자기하지도 않다.
碑峰 자락에 이르면 「비봉에 오르다가 추락하여 죽는 사람이 많다」는 요지의 경고문이 게시되어 있다. 등산이라면 「王초보」인 필자는 잔득 겁을 집어먹고 碑峰의 가파른 바위 위를 거의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갔다. 뒤를 돌아 보니 자칫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하면 사망 아니면 중상을 입을 것 같았다.
碑峰 정상에 이르니 오뉴월 뙤약볕 아래인데도 그야말로 간담이 서늘했다. 바람도 내 몸뚱이 하나쯤은 휙 날려갈 만큼 세찼다. 이곳은 북한산에서도 사방이 확 틔어서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이다. 남서쪽으로 서울의 案山(안산)인 南山이 가깝게 다가오고, 그 너머로 한강이 그림처럼 흘러가고 있다. 필자는 아직 한강처럼 잘 생긴 강을 본 적이 없다. 여의도 63빌딩 같은 건 장난감 같다. 북서쪽으로는 서울 은평구와 고양 일대의 평원 지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碑峰 정상에는 비록 모조품이지만 진품처럼 만든 「진흥왕의 순수비」가 우뚝 세워져 있다. 손가락으로 순수비의 字體(자체)를 하나하나 더듬으면서 「나」라는 個體(개체)의 역사성을 음미했다.
빗돌의 형태는 長方形(장방형)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다듬은 석재이며 윗부분에 1단의 축을 만든 것을 보면 원래 갓돌(蓋石)로 씌웠던 것으로 보인다. 碑身은 높이 154cm, 폭 71cm, 두께 16cm이다.
碑文(비문)은 12行에 걸쳐 쓰여져 있다. 비바람에 심하게 마멸되어 전혀 판독할 수 없거나 자획이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1행의 字數는 30字 전후. 筆法(필법)은 중국 六朝式의 楷書(해서)이고, 글자의 지름은 약 3cm이다.
秋史 金正喜의 역사적 공로
판독할 수 있는 글자에 의하면 碑文의 내용은 주로 眞興王의 공덕과 왕이 국경지역을 돌아본 목적, 그리고 왕을 수행했던 신하들의 이름들로 이루어져 있다.
碑의 측면에는 조선 純祖 16년(1816) 7월에 조선조 최고의 명필이며 金石學의 대가인 秋史 金正喜(추사 김정희)가 金敬淵(김경연)이란 사람과 이 곳을 답사했고, 이듬해 6월8일에도 다시 趙寅永(조인영)과 함께 와서 碑文 중 68字를 판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秋史는 그 후 2字를 더 판독하여 현재까지 세상에 알려진 글자수가 모두 70字에 이르게 되었다.
秋史 이전에 사람들은 북한산 봉우리 하나에 비가 우뚝 세워져 있어 그 곳을 막연히 「碑峰」이라고 부르기만 했지, 정작 그것이 무슨 碑인지는 몰랐었다. 조선 太祖의 王師(왕사)였던 無學대사의 碑라고 잘못 口傳(구전)되기도 했다.
순전히 필자의 생각이지만, 碑峰의 碑에 새겨진 글자의 뜻을 판독한 것은 秋史가 어릴 적부터 가졌던 꿈을 실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秋史는 경복궁 옆 지금의 孝子路(효자로) 연변의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런 만큼 동무들과 더불어 북한산에 자주 올랐을 것이다. 북한산에 오르기만 하면 코끼리처럼 웅크리고 있는 바위 봉우리, 그곳 암반 위에 오연히 세워진 古碑(고비) 하나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것이다. 碑文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 의문이 추사 金石學의 출발점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秋史는 진흥왕 순수비의 존재를 확인해 줌으로써 韓國史의 중요한 의문부호 하나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삼국시대의 세 나라 중 가장 후진적이었던 신라는 진흥왕 때 들어서야 비로소 고구려의 南進勢를 꺾고, 伽倻諸國(가야제국)을 병합하여 낙동강의 경제력을 움켜 쥐었으며, 백제의 中興主이던 聖王을 敗死(패사)시키고 한강 유역을 독차지한 데 이어 동북변 영토를 지금의 함경남도 지역까지 확대했다.
6·25 총탄 흔적
특히 신라의 漢江 유역 확보는 100여 년 후 신라의 삼국통일에 결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러한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 진흥왕은 낙동강 서쪽지역에 昌寧碑(창녕비:국보 제33호), 함남지역에 黃草嶺碑(황초령비)와 摩雲嶺碑(마운령비), 그리고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다.
진흥왕 순수비는 고구려 廣開土王 陵碑(광개토왕 능비), 中原 고구려 碑(국보 제205호), 신라의 울진 봉평리 碑(국보 제242호)와 영일 냉수리 碑(국보 제264호)와 더불어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나라의 옛 碑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필자는 경복궁 동편에 있는 중앙박물관에 가서 북한산 순수비의 진품을 다시 한번 관찰했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모조품 그대로였다. 碑身 후면에 곰보자국이 무수했는데, 알고 보니 6·25 전쟁 때 얻어맞은 소총 彈痕(탄흔)이었다. 이 사실도 어김없는 민족사의 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진흥왕 순수비를 넋을 잃고 쳐다 보다가 필자는 문득 秋史 선생에게 감사의 심경을 주체하지 못했다. 字體(자체)가 마모되어 필자의 눈으로는 한 字도 읽을 수가 없는데, 선생은 「眞興太王及重身等巡狩管境之時記」로 시작되는 碑文 중 무려 70字나 해독해 주었기 때문이다.
국보 제4호 高達寺 터 浮屠
신라 절터의 애잔한 抒情과 대담한 돌새김
月刊朝鮮 국보 답사팀(?)은 趙甲濟 편집장 등 무려 다섯 명이나 成群作黨(성군작당)하여 高達寺(고달사) 터 浮屠(부도)를 보러 아침 일찍 길을 떠났다. 마침 휴일이어서 「임도 보고 뽕도 딴다」는 목적 때문에 답사팀의 인원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었다.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1-1번지에 소재한 高達寺는 KBS TV의 인기 역사극 「太祖 王建」(태조 왕건)으로 다시 한번 세인들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극중에서 대단한 카리스마의 인물로 미화된 弓裔(궁예)가 등극 전의 떠돌이 시절에 중이 되기 위해 처음으로 落髮(낙발)을 했던 절로 口傳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浮屠라면 이름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한 탑인데, 高達寺 터 浮屠의 주인공은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다. 그런데도 이것이 국보 제4호로 꼽혔다면 대단한 미술사的 가치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여주는 조선왕조 최고의 聖君인 世宗大王의 英陵(영릉:능서면 왕대리 山 83-1번지)과 孝宗의 寧陵(영릉:英陵과 500m 상거함), 그리고 남한강변의 절경에 위치하여 영화나 TV드라마의 로케이션 장소가 되는 神勒寺(신륵사)로 이름난 고장이다.
英陵을 모시는 사찰인 神勒寺에는 국보는 없지만, 보물 225호 多層石塔(다층석탑), 보물 226호 多層塼塔(다층전탑), 보물 230호 大藏閣記碑(대장각기비), 보물 228호 普濟尊者石鐘(보제존자석종), 보물 229호 普濟尊者石鐘碑, 보제존자석종 앞 石燈, 보물 180호 祖師堂(조사당) 등이 집결된 「寶物天國」(보물천국)이다.
이곳들과 高達寺 유적을 잘 묶기만 하면 여주는 수도권과 가깝게 연결되는 大문화관광권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조선왕조 때 이미 폐허화된 高達寺 터는 뜻밖에 여주 사람들도 가는 길을 잘 몰랐다.
우선 남한강변에 있는 여주읍내의 음식점 「여주쌀밥집」에 들러 길도 묻고 요기도 하기로 했다. 여기서 일행 중 한 사람은 7000원짜리 쌀밥을 무려 두 그릇 반이나 먹어 치워 일행의 기를 팍 죽여 놓았다. 一等米(일등미)로 평판이 높은 여주쌀로 지은 뚝배기밥과 고추장으로 버무린 콩나물무침이 이 음식점의 자랑거리였다.
옛 속담이지만 「배가 부르면 조선총독부도 눈 아래로 보인다」고 했던가. 답사팀은 기세좋게 읍내에서 큰 다리를 건너 북내면으로 진입했다. 여기서 우회전하면 神勒寺로 가는 길이며, 高達寺로 가려면 좌회전하여 북서쪽으로 난 37번 국도를 20리쯤 올라가다가 율촌 마을에서 우회전하여 88번 지방도로를 15리쯤 달리면 오르막길로 접어드는데, 그 중간 오른편으로 고달사로 가는 진입로가 있다. 안내판이 손바닥만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진입로를 따라 1km쯤 들어가면 기품 있는 420년짜리 느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다.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몸통 둘레가 2.2m다. 이것 하나로 이곳이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여기서 下車하여 완만한 오르막길을 따라 모롱이 하나를 돌아서면서 숨이 막힐 듯한 기쁨을 느꼈다. 그 곳은 궁궐이라도 들어설 만한 넓은 대지 위에 역사의 현장 高達寺의 폐허가 벗은 그대로 펼쳐져 있다. 「속곳」도 입지 않은 高達寺의 속살을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일대 장관이었다. 서울 가까이에 이런 좋은 곳이 있는데, 여태 무엇을 하느라고 찾아오지 않았던가? 뒤늦게라도 여기에다 내 발자국을 남길 수 있게 된 데 감사했다. 거기에는 옛 高達寺의 주춧돌 등의 遺構(유구)가 깨알같이 널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걱정스러웠다. 왜냐하면 「북내면 상교리 411-1번지 일대 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학술조사/조사기간 2000.11.1」이라고 쓰인 안내판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는 유적을 복원한답시고 숱한 문화재를 왜곡화하거나 천박스럽게 改惡해 왔던 바보짓을 거듭해 왔던 것 아닌가.
폐허는 폐허대로 아름답다. 여기다 날림으로 무엇을 세우고 울긋불긋하게 색칠을 해놓으면 우리는 역사의 본전을 잃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는 뿌리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 아닌가? 高達寺 옛터는 國寶 하나에 寶物 셋을 품고 있는 민족문화의 보고다. 우두산(473m)의 너른 품을 독차지하고 있는 高達寺는 통일신라의 전성기인 景德王(경덕왕) 24년(764)에 창건된 이름난 절이다. 排佛崇儒(배불숭유)를 國是로 삼은 조선왕조 때 廢寺(폐사)되어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國寶와 寶物로 갈라 놓은 「돼지코의 힘」
국보 제4호 浮屠는 高達寺 뒤편의 야산 능선에 자리잡고 있다. 첫 인상을 낱말 하나로 표현하라면 바로 「힘」이었다. 中臺(중대)의 돋을새김(陽刻)된 거북은 머리를 정면으로 내밀고 있는데, 그 들창코가 하늘을 향해 사정없이 쳐들고 있다. 거북을 중심으로 꿈틀거리며 승천하는 네 마리의 용과 구름 무늬도 조각되어 있다. 그 솜씨가 역시 남성적이고 대담하다. 반면 팔각 탑신의 각 면에는 창문형[門扉形]과 四天王像(사천왕상)이 신라 특유의 여성적인 선으로 섬세하게 양각으로 마감되어 절묘한 콘트라스트를 이룬다. 부도의 높이는 3.4m.
두터운 지붕에는 팔각의 꼭지마다 높직한 귀꽃이가 발기나 한 듯이 직각으로 곧추서 있다. 아쉬운 것은 천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면서 비바람과 햇볕을 맞아 上下의 귀꽃이 16개 가운데 10개가 떨어져 나가고 탑신 곳곳에 白花(백화)현상이 나타나 석재가 스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천년의 풍우는 그 억센 화강암도 견디지 못하나 보다.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 이 國寶는 신라 부도의 기본형을 충실히 따르면서 고려시대의 양식도 강하게 풍기고 있다. 신라 말기 景文王 때 입적한 고승 圓鑑大師(원감대사)의 묘탑이라는 설도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각 부분의 양식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 光宗 9년(958)에 90세의 나이로 입적한 元宗大師(원종대사)의 惠眞塔(혜진탑:보물 제7호)보다 조금 앞서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혜진탑은 高達寺 부도가 있는 곳에서 돌계단을 따라 100m쯤 내려온 위치에 세워져 있다. 高達寺 부도를 본뜬 것으로 보이는데, 규모가 좀 작고 양각된 거북의 머리도 옆으로 돌려 왠지 박력이 떨어진다. 매우 섬세하고 우아한 고려 초기의 대표적 걸작품이긴 하지만, 답사를 해보면 高達寺 부도처럼 국보가 되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독창성과 힘이 떨어지기 때문인 듯하다.
高達寺 터 경내에는 이밖에 보물 제8호인 石佛座(석불좌)도 남아 있고, 高達寺 부도가 위치한 야산의 背斜面(배사면)에서 우두산 발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遺構가 발견되고 있다.
高達寺가 궁예가 처음으로 머리를 깎고 중이 된 절인지는 傳言(전언)이야 어떻든 문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三國史記」 궁예傳에 의하면 궁예가 落髮한 곳은 「世達寺」(세달사)로 되어 있고, 「世達寺는 지금의 興敎寺(홍교사)다」라고 부연되어 있다.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흥교사가 開城(개성) 근교에 소재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高達寺가 世達寺로 이름이 바뀌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국보 제5호 法住寺 쌍사자 石燈
통일신라의 氣像을 두 마리의 사자로 표현
入山修道의 길
필자는 法住寺(법주사)가 좋아서 신혼여행지로 삼았을 정도로 여러 번 답사했다. 法住寺는 그곳에 이르는 길부터 압권이다.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西청주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와 청주 도심을 관통하는 36번 국도로 거쳐 청주시청 조금 못 미친 지점에서 25번 국도로 들어 1시간쯤 달리면 古戰場(고전장)인 三年山城과 만난다(3년에 걸쳐 축성했던 까닭에 삼년산성이란 명칭이 붙었다).
지금의 보은읍 대야리에 위치한 三年山城은 서기 553년 백제 聖王의 아들 餘昌(여창)이 백제·가야·왜국의 연합군 3만명을 거느리고 웅거하다가 金庾信(김유신)의 조부인 武力(무력) 휘하 신라군의 공격을 받고 궤멸적 타격을 입었던 현장이다. 이때 왕자 餘昌(여창)이 單騎(단기)로 신라군의 포위망을 뚫고 백제의 都城으로 귀환했는데, 그가 바로 聖王을 이은 威德王(위덕왕)이다.
당시의 백제군은 참으로 불운했다. 전선사령관이었던 왕자 餘昌이 삼년산성에서 갑자기 병을 얻어 당초 전략대로 신라를 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에 聖王이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불과 50騎를 거느리고 삼년산성으로 달려가다 지금의 大田 동남부인 식장산에서 新州軍主(신주군주) 金武力 휘하 裨將(비장) 都刀(도도)가 깔아둔 복병에 걸려 생포되고 말았다. 聖王은 신라군 진영에 끌려가 참수되었다. 역사의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당시의 戰法(전법)대로라면 신라군의 攻城부대는 聖王의 목을 삼년산성의 성문 앞으로 들고 나가 여봐라고 호령함으로써 백제군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렸을 것이다.
필자가 法住寺를 자주 찾아가는 것은 古戰場 답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만이 아니다. 삼년산성 앞에서 法住寺에 이르는 말티고개의 절경 때문이다. 요즘은 말티고개의 도로폭이 크게 확장되었지만, 굽이굽이 S자로 꺾어진 모습은 여전하다. 35년 전 필자는 처음 속리산으로 여행을 가다가 말티고개에서 엔진이 꺼진 고물 버스로부터 다른 승객들과 함께 下車하여 뒤에서 밀고 올라갔던 경험도 있다.
말티고개를 넘어서면 길 양편의 가로수가 가지를 뻗어 공중에서 서로 만나고 있다. 말티고개는 조선조의 7代 임금 世祖가 속리산으로 첫 행차를 할 때 輦(연)을 타고 넘을 수 없어 말로 바꾸어 탔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그 밑을 지나면 法住寺를 품은 산의 이름을 왜 범속할 俗(속), 떠날 離(리)로 지었는지, 그 까닭을 느낄 수 있다.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俗世를 떠나 이곳에 入山修道(입산수도)했다는 유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요즘 法住寺 앞 상가지역은 관광객들로 꽤 흥청거린다. 여기서 맛볼 만한 음식은 속리산 나물로 만든 「산채비빔밥」이다. 이제는 상업화되어 업소마다 다 고만고만하지지만,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제1의 요소는 역시 재료가 아닌가. 일행 세 명이 5000원짜리 산채비빔밥 하나씩에다 1만원짜리 더덕구이 한 접시를 곁들이니 점심 치고는 훌륭했다. 승용차 주차료는 하루 3000원이다.
상가지역을 출발하여 주위를 기웃거리며 20분쯤 걸어가면 水晶橋(수정교)에 이른다. 약 2km에 달하는 이 길은 큰 느티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등이 어우러져 터널을 이루고 있다. 「오리숲」이라는 별칭은 숲의 길이가 5리가 된다고 해서 붙여졌다.
法住寺에 들어가려면 공원입장료 1300원, 문화재 관람료 1900원, 합계 3200원을 내야 한다. 수백 가지의 國寶, 보물, 문화재 등을 전시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료가 700원인 것에 비교하면 만만찮은 금액이다.
두툼한 어깨, 도톰한 궁둥이
法住寺의 바깥문인 一柱門(일주문)에는 「湖西第一伽藍」(호서제일가람)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다. 法住寺는 신라 진흥왕 14년(553) 義信祖師(의신조사)가 삼국통일의 祈願道場(기원도량)으로 창건한 이래 혜공왕 12년(776) 眞表律師(진표)가 금동미륵3존불상을 조성, 法相宗(법상종)의 3大 가람의 하나가 된 유서 깊은 절이다.
法住寺 경내의 한 복판에 사자 두 마리가 石燈(석등)을 떠받들고 있는 형상의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이것이 바로 국보 제5호 법주사 雙사자 石燈이다. 석등은 부처님의 加被(가피:부처나 보살이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이롭게 함)로 여러 가지 재앙을 예방하고 明朗生活(명랑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종교적 구조물이다. 이 석등의 조성연대는 신라 聖德王 19년(720)으로 추정되고 있다. 높이는 3.3m.
신라의 石造 유물 중에는 한국에 서식하고 있지 않은 사자를 이용한 것이 적지 않지만, 국보 제5호의 사자 조각은 단연 제일류다. 두 마리의 사자가 뒷발로 서서 앞발을 뻗어 石燈을 받들고 있는데, 안정감이 뛰어나며, 기법 또한 기발하고 대담하다. 전형적인 양식과는 달리 石燈의 竿柱石(간주석)을 石獅子(석사자)로 대치한 것이다.
그 위의 火舍石(화사석)은 8角形으로 훨씬 높은데, 4개의 火窓(화창)은 아주 낮다. 꺼지지 않는 진리의 등불이 온 세상을 향해 멀리 멀리, 그리고 아래로 아래로 퍼져 나가라는 慈悲心(자비심)이 아니겠는가?
국보 제55호 법주사 捌相殿(팔상전) 相輪部의 쇠꼬챙이가 피뢰침 구실, 우리나라 最古 목조건물로 살아 남아
匠人의 시대정신
다른 石燈에 비해 火舍石과 옥개(지붕)가 큰 것도 특징 중의 하나다. 그런데도 위가 무거워 아슬아슬한 假分數(가분수)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石燈을 떠받치고 있는 두 마리의 사자가 매우 억세 보이기 때문이다. 사자의 두툼한 어깨와 크지 않으면서도 탄력성 있는 엉덩이가 그런 신뢰성을 주는 포인트인 것 같다.
통일신라의 전성기 때 만들어진 이 조각품엔 그 시대의 씩씩한 기상이 표현되어 있다. 이런 시대정신이 匠人(장인)의 손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했던 것이 아닐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부분은 8각 지대석 위의 下臺蓮花石(하대연화석)으로부터 雙사자 위의 上臺蓮花石(상대연화석)까지가 모두 하나의 돌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구조가 튼실해 보인다.
그러나 이 雙사자 石燈도 1300년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훼손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火舍石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사자의 갈기 부분과 꼬리 등이 부스러지거나 떨어져 나갔다. 보수가 시급하다.
국보 제64호 법주사 石蓮池
호수를 돌그릇에 담다
왜 比例가 맞지 않게 보이는가
法住寺 경내에는 國寶 세 개가 100m도 되지 않는 거리를 두고 상거해 있다. 한 장소에서 國寶 셋을 한꺼번에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국립박물관에서가 아니라면 드문 행운이다.
國寶 제5호 雙사자 石燈 바로 옆에 國寶 제55호 팔상전이 서 있다. 팔상전 내부에는 석가모니의 일생을 여덟 가지 모습으로 나타낸 탱화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法住寺의 5층 석탑을 팔상전이라고 이름지은 듯하다.
팔상전은 아름답고 정중하다. 현존하는 한국의 古塔(고탑) 중에서는 제일 높다. 전체 높이가 22.7m에 이른다. 1984년 4월30일 雙峰寺(쌍봉사)의 대웅전으로 사용되던 3층 목조탑이 소실됨으로써 최근에 건설된 충북 鎭川(진천)의 統一大塔(통일대탑)을 제외하면 한국 목조탑의 유일한 존재가 된 중요 건축물이다. 가장 오래된 고층 목조건물인 것이다.
신라 진흥왕 14년(553)에 처음 지어져 조선 仁祖 4년(1626)에 碧巖禪師(벽암선사)에 의해 재건되었고, 1968∼69년에 완전 해체한 다음 복원공사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층과 2층은 정면 5칸, 측면 5칸이고 3층과 4층은 정면과 측면이 3칸, 5층은 정면과 측면이 모두 2칸의 正方形(정방형)으로 되어 있다. 길고 짧은 기둥의 숫자가 모두 561개이다.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중심기둥 하나로 통해 있는 것이 이 건물의 특징이다. 지붕은 紗帽形(사모형)이며 그 위의 相輪部(상륜부)가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다. 相輪部에 있는 쇠고챙이 모양의 擦柱가 피뢰침 구실을 하여 落雷(낙뢰)의 공격을 막아 왔다.
木共包의 양식은 1층부터 4층까지는 기둥 위에만 包를 짠 柱心包式(주심포식)이나 5층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柱間)에도 包를 짜 올린 多包式(다포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목거리다. 밖에서는 5층으로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5층까지 하나로 통해 있는 통칸이다. 내부 중앙에는 心礎石(심초석) 위에 心柱(심주)를 세웠다.
팔상전의 佛像(불상) 배열은 東에서부터 南, 西, 北으로 봉안하여 마지막 북쪽에는 부처가 열반하여 누워 있다.
지금의 팔상전은 그 높이에 비해 땅딸막하고 둔탁하게 보이는 것이 흠이다. 사진작가 金大壁씨는 『팔상전의 比例가 맞지 않게 보이는 것은 어느 땐가 보수공사를 하면서 下月臺(하월대:아래 基壇)의 어깨 부분까지 흙으로 메워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下月臺 부분을 덮은 흙을 파내어 팔상전의 날렵한 제모습을 되찾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보 제41호 龍頭寺 터 鐵幢竿
高麗 초기의 國威와 세계적인 製鐵 수준을 증언
國寶는 금이 가는데 새 佛像에 금칠하는 아이러니
法住寺 마당에는 화강석으로 만든 큰 石槽(석조)가 있다. 국보 제64호 법주사 石蓮池(석연지)다. 이 돌그릇에다 石蓮池란 이름을 붙여 놓은 바람에 불교도가 아니면 자칫 「연못」쯤으로 오해하기 쉽다. 원래 石蓮池는 8세기경에 제작된 통일신라시대의 걸작품으로서 法住寺의 본당이었던 龍華寶殿(용화보전:소실됨)의 莊嚴品(장엄품)으로 설치했던 것이다.
8각의 지대석 위에 3단의 굄돌에 또 한 층의 伏蓮臺(복련대)를 더하고, 다시 그 위에 구름 무늬로 장식된 竿石(간석)을 놓아 石蓮池를 떠받쳤다. 마치 연꽃이 구름 위에 둥둥 뜬 듯한 모습이다. 극락세계의 蓮池(연지)를 상징하는 것이다.
蓮池 표면에는 밑으로 素文(소문)의 연꽃잎을 돌렸고, 그 윗부분에는 겹잎연꽃을 장식했다. 연꽃잎 안에는 불교에서 理想化(이상화)하는 寶相華文(보상화문)이 새겨져 있다.
蓮池는 내부를 파서 중요 의식 때 물을 담게 했고, 蓮池 테두리 위에는 난간을 돌렸다. 난간의 밑은 네모난 기둥 모양을 새겼다. 높이 1.95m, 둘레 6.65m. 석조물 전체에 연꽃, 구름, 난초, 덩굴 등의 무늬가 어우러져 매우 아름답다.
그러나 石蓮池는 대단한 상처를 입고 있다. 지금 몸 전체에 금이 가 쇠붙이로 연결시켜 놓았다. 철심을 박아 넣고 그 위에 시멘트로 땜질해 놓았는데, 보수작업의 모양새로 미루어 匠人의 솜씨는 아니었다. 난간 역시 파손되어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法住寺에선 새로 만든 거대한 청동미륵대불상에다 금칠을 하는 일에 몰두해 있다. 이른바 蓋金佛事(개금불사)가 진행중이다. 이 청동미륵대불상은 약 8m 의 화강석 기단 위에 높이 25m, 둘레 17m 짜리로 동양 최대의 入佛像(입불상)이라는데, 거기에 소요된 청동만도 무려 160t에 이르렀다고 한다.
번쩍번쩍 빛나는 이 청동미륵대불상은 法住寺와 俗離山의 경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국보 제5호 雙사자 石燈, 국보 제55호 팔상전, 국보 제64호 石蓮池를 왜소하게 만들고 있다. 뭐든 크고 웅장하기만 하면 좋은 것인가?
이 청동미륵대불상을 장식하는 보살상이나 조각무늬 등에서 창의성 같은 것은 발견할 수 없었다. 경주 석굴암의 金剛力士(금강역사)를 흉내낸 것이거나 金庾信(김유신) 장군 묘에 설치된 난간을 본뜬 것 등이었다. 이런 조형물은 제 아무리를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문화재의 반열에 오르기 어렵다. 요즘 나라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데, 일부 사찰의 佛事들을 보면 이런 행태가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세계 일류였던 건국 초기 고려의 製鐵 수준
답사팀은 俗世(속세)를 떠났다가 다시 俗世로 돌아왔다. 온 길을 되돌아가면서 길목에 있는 국보 제41호 龍頭寺(용두사) 터 鐵幢竿(철당간)을 놓칠 수는 없었다. 하루 만에 국보 4개를 취재한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며 눈의 사치가 아니겠는가고 생각되었다.
幢竿(당간)이라면 불교 의식 때 佛撞(불당), 즉 불교계의 각종 깃발을 달아 세우는 긴 막대기 모양의 목제 또는 철제 게양대다. 청주시 龍頭寺 터에 있는 당간은 나무가 아닌 쇠로 만들었다고 해서 鐵당간인 것이다.
불교를 국교로 삼은 신라, 고려 때 지은 수많은 절에는 반드시 절 입구에 幢竿이 있었으나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거의 사라져버렸다. 현존하는 것은 國寶 제41호 용두사 터 鐵당간과 충남 공주 甲寺(갑사) 鐵당간 두 개뿐이다. 그러나 당간을 받치던 石造支柱(석조지주)는 전국 곳곳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산재해 있다.
龍頭寺 터 鐵당간은 청주의 도심인 남대문로 2가 청주백화점 뒤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 鐵당간 주변인 「철당간길」과 「성안길」 일대는 충주의 젊은 층들이 몰리는 패션街가 되어 있다. 이 만큼 멋들어진 鐵당간을 세운 절이라면 그 규모가 상당했을 터인데도 鐵당간 이외엔 용두사의 다른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용두사 터 鐵당간은 화강석으로 된 石造支柱가 양쪽에서 떠받드는 사이로 높이 12.7m의 위용을 뽐내고 있다. 당간은 소형 드럼통 모양의 鐵桶(철동) 20개를 차곡차곡 쌓고 용접을 하여 연결한 모습이다.
이 鐵당간에서 주목할 것은 밑에서부터 세 번째인 원형 철통 표면에 「龍頭寺鐵幢記」(용두사철당기)라는 표제로 시작되는 銘文(명문)이 돋을새김(陽刻)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銘文으로 건립연대가 峻豊(준풍) 3년, 곧 고려 光宗 13년(962) 3월29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光宗은 재위 10년까지 光德(광덕)이라는 年號(연호)를 사용하다가 재위 11년차부터 峻豊이란 연호로 바꾸어 썼다. 건국 초기의 高麗가 中原(중원)의 宋, 북방의 신흥강자 遼(요)와 더불어 대등한 외교관계를 유지했다는 얘기다.
이것으로 건국 초기 고려의 국제적 位相(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절의 製鐵(제철) 수준도 가늠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鐵당간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당간의 鐵材는 천년의 풍우에도 생생한 모습이다. 고려의 製鐵 기술이 당시 세계의 최고 수준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계속)●